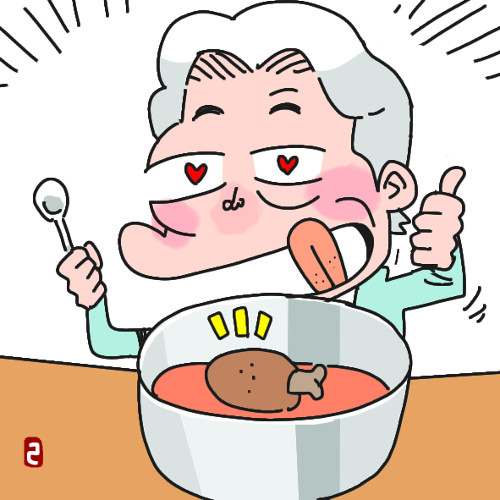
30여년 전, 의정부 망월사역 앞 개울가 ‘101보’에서 몇 밤 잔 뒤 쪽빛 군복에 트럭 타고 신병교육대로 갔지요. 돌아가는 세탁기 안 빨래처럼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던 때였습니다. 점심에 돼지고기된장국이 나온 날, 재수가 좋아 국통 바닥에 가라앉은 덩어리고기들을 배식받는 행운이 왔습니다. 콘크리트 식탁 의자에 죽 앉아 입에 퍼 넣기 시작했는데, 옆 애가 오랜만에 고기 맛을 봐서 실성을 했는지 피식 웃더니 “와, 왕거니네. 와” 하는 거였습니다. “동작 그만. 어쭈, 웃어…. 식사 끝.” 매의 눈이 달린 것으로 의심되던 조교에게 딱 걸렸지요. 5분지 4나 남았는데, 입은 있으나 사정도 못 하고 왕거니들을 버릴 낙담에 눈물이 핑 돌 지경이었습니다. “잔반통에 버릴 때 서너 개 집어 입에 넣자.” 단단히 결심했지요. 식기를 탁탁, 턴 뒤 고기 몇 점 움켜쥐어 얼른 입에 가져가려는데, “동작 그만.” 그 왕거니를 손에 쥔 채 연병장을 돌고 돌고 한 게 어제 같습니다.
좀 대단한 게 걸려든 걸 ‘왕거니’라고 하지요. 왕거니는 기름이나 힘줄, 뼈 등을 발라낸 살코기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 방면 사람들의 은어인데, 왕거니가 크고 대단하다는 뜻으로 널리 쓰이는 것은 먹는 게 변변찮던 시절 살코기라니, 깜짝 놀랄 만한 대단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 아닐까요.
남의 실수나 작은 약점을 잡아 무슨 왕거니라도 건진 듯 물고 늘어지는 이들을 봅니다. 자신을 돌아본 적 없는 이들의 뻔뻔함입니다.
어문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