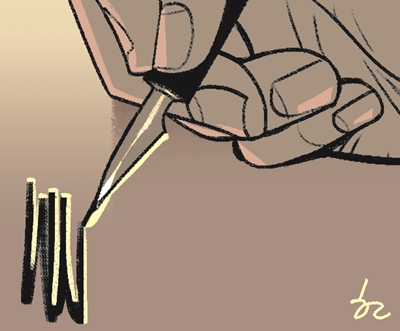
마감 시간에 쫓겨 기사를 써야 하는 기자들은 퇴고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퇴고는커녕 원고지에 써서 팩스로 보낼 시간조차 없을 때는 전화로 기사를 부르던 시절도 있었다. 수첩에 적힌 메모만 보고 원고지 여러 장 분량의 기사를 부르는 선배 기자들의 내공은 후배 기자들의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신뢰한 필사였던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은 퇴고를 거듭하는 스타일이다. 그는 최근 출간한 ‘윤태영의 좋은 문장론’에서 초고를 쓰는 데 하루가 걸렸다면 고치는 데는 최소한 사나흘 동안 공을 들인다고 했다. 좋은 글은 잘 쓰기보다 잘 고칠 때 탄생한다는 것이다.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 제1부속실장,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그는 노 전 대통령 곁에서 일거수 일투족을 기록하고 군더더기 없이 담백하게 핵심을 전달하는 글을 쓰곤 했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함, 결과의 정의라는 국정운영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초고의 이 문장을 그는 이렇게 고쳤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것을 국정운영의 원칙으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일상의 쉬운 언어로 쓰라는 것이다. 명문을 만들려고 무리하게 힘을 주다가 글이 어색해지곤 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힘을 쫙 뺀 상태에서 이해하기 쉽고 편한 낱말들로 글을 쓰는 것이 좋은 문장의 시작이고 끝이라는 설명이다. 내용이 좋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평균 수준의 글 실력을 갖췄다면 어차피 콘텐츠에서 승부가 갈리기 마련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쉬운 글의 중요성은 학문에도 적용된다. 대학 동창은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뒤 회계학 책을 썼다. 그는 “네 와이프가 읽어봐도 이해하게 썼다”고 말했다. 집사람은 회계학을 공부한 적이 없는 평범한 주부다. 그는 기존 회계학 책이 얼마나 어렵게 써져 있는지를 비판하기도 했다. 학문적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일부러 어렵게 쓴 책도 있다는 것이다. 그가 쓴 책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아주 많이 팔렸다. 학원도 차린 그는 이렇게 번 돈으로 국내 유일의 세무대학을 설립했다. 웅지세무대 송상엽 설립자 얘기다. 다듬고, 힘을 빼고, 내용을 채우는 것이 글을 쓰는데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을까.
신종수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