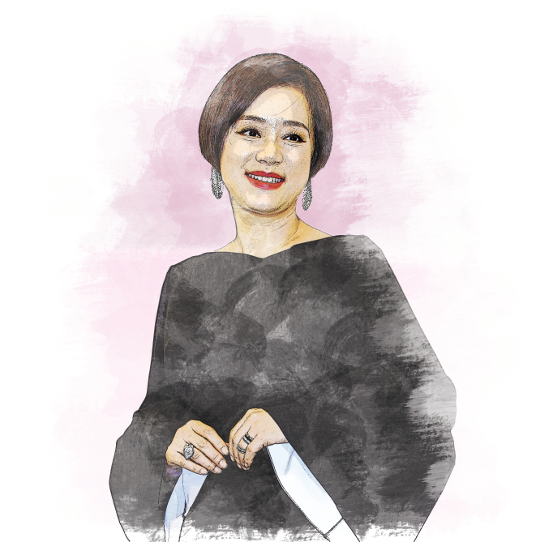





문희 윤정희 남정임이 1960년대 여배우 트로이카였듯, 70년대에도 신(新)트로이카로 일컬어졌던 치명적 매혹의 세 톱스타가 있었다. 정윤희 유지인 그리고 장미희다. 영화와 TV 드라마를 오가며 맹활약을 펼쳤던 이 세 디바는, 장미희를 기념비적 스타덤에 등극시킨 ‘겨울여자’(감독 김호선·1977) 이후 정윤희가 84년 결혼과 더불어 은퇴할 때까지 7년가량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인기 정상을 다퉜다. 그 순서는 대략 정윤희-장미희-유지인 순이었다.
한국영화 속 당찬 여성상의 시초
하지만 내게는 늘 장미희였다. 미모의 우열에 대해선 논하지 않으련다. 팬들의 호불호나 인기의 세기에서 적잖이 갈렸으나, 대표작들의 면면에서나 스타-연기자로서 생명력에서 두 디바를 압도해왔다. 영화로 한정하자. 정윤희의 대표작은 이두용 감독의 ‘최후의 증인’(1980), 정진우의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1980)와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1981), 임권택의 ‘안개 마을’(1983) 정도다. 유지인은 정소영 감독의 ‘마지막 겨울’(1978), 정진우의 ‘심봤다’(1979), 이장호의 ‘바람 불어 좋은 날’(1980), 이두용의 ‘피막’(1980), 배창호의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1984) 정도이고. 장미희는 ‘겨울여자’를 비롯해 김기영의 ‘느미’(1979), 배창호의 ‘적도의 꽃’(1983)을 넘어 ‘깊고 푸른 밤’(1985) ‘황진이’(1986) ‘사의 찬미’(1991) 등으로 90년대로까지 이어진다.
정윤희에게 제19회와 20회 거푸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안긴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와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 그리고 2003년 전주국제영화제 등에서 개봉 버전보다 1시간 긴 150여분으로 복원된 이래 이두용 필모그래피를 넘어 한국영화 100년사의 으뜸 걸작 중 하나로 간주돼온 ‘최후의 증인’이 있고, 유지인에게는 올 24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 100년사, 위대한 정전 10선’ 중 한 편으로 선보인 한국 리얼리즘 영화의 걸작 ‘바람 불어 좋은 날’과, 한국영화로는 처음으로 소위 3대 국제영화제 중 하나인 베니스영화제 본선에 입성한 ‘피막’이 있거늘, 장미희가 두 디바를 ‘압도’한다고? 언뜻 헛소리로 비치기도 한다. 장미희의 그 어느 대표작도 영화의 미학적 수준에서 ‘최후의 증인’과 ‘바람 불어 좋은 날’에는 미치지 못하지 않는가.
그러나 세 여걸이 구현한 캐릭터의 주체성이나 성격화, 연기의 질감, 극적 비중 등에 시선을 고정시키면 사정은 급변한다. 정윤희나 유지인은 장미희의 캐릭터들에 비해 결코 주도적·주체적·능동적이지 않다. 주연보다는 조연에 가깝기도(‘최후의 증인’ ‘바람 불어 좋은 날’) 하며, 연기의 집중력에서도 강도가 뒤처진다. 소녀와 창녀의 이미지를 동시에 체현하며 “현대 여성의 파격적인 성 모럴 묘사로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이하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참고·인용) ‘겨울여자’의 이화부터가 그간의 한국영화에서 목격할 수 없었던 새롭고 도발적인, 희대의 캐릭터였다.
일각에서는 “어안이 벙벙한 난장판”(정영일) 등의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젊은 관객층에게는 크게 어필했다. 133일간 58만6000명(서울 기준)을 동원하며, 90년 ‘장군의 아들’(임권택·67만9000명)에 의해 깨지기 전까지 한국영화 역대 흥행 1위작이란 기록을 지니고 있었다. 또 ‘겨울여자’의 역사적 성공은 꽉 막혀 있던 한국영화계에 일말의 숨통을 터주었다. 외국영화로 벌 수 있는 수익을 상회하는 흥행 실적을 올림으로써 대한민국 제작자들에게 “한국영화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표본을 제시해주면서.
한국영화 100년사에 이화처럼 발칙하면서도 당찬 여성 캐릭터는 없었다. ‘별들의 고향’(이장호·1974)의 경아(안인숙)나 ‘영자의 전성시대’(김호선·1975)의 영자(염복순)의 존재감이 약화될 만도 하다. 그 캐릭터를 열연한 주인공이 다름 아닌 장미희였으니, 다른 두 여걸을 압도한다고 한들 과장은 아닐 터. 그 전해인 76년, 268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성춘향전’(박태원)의 춘향으로 발탁됐을 때 이미 그 전조가 제시되었지만 말이다.
이듬해 ‘별들의 고향(속)’이 흥행 1위작이 되면서 장미희는 ‘흥행 퀸’의 자리에 올랐다. 하길종 감독 특유의 감각적 미장센 연출 등에 힘입어 세련된 멜로드라마로 빚어졌다고는 하나, 경아를 축으로 전개됐던 전편과 달리 문호(신성일)를 중심으로 펼쳐지니 만큼 넘어가자. ‘갯마을’(김수형·1978) ‘야시’(박남수·1979) 등도 흥행 선전을 펼쳤으나, 영화적 수준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만큼은 아니니 역시 논외로 치자. 우리는 그동안 이화에서 ‘적도의 꽃’의 선영과, ‘깊고 푸른 밤’의 제인으로 바로 넘어가곤 했다. ‘고래사냥’(1984)과 더불어 배창호 감독을 80년대 최고 흥행작 메이커로 만들어준 문제작들의 캐릭터로.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거머쥔 선영과, 수상은 못했어도 그 못잖은 인상적 호연을 보인 제인 또한 좀처럼 보기 쉽지 않았던 파격의 캐릭터들이다. 안성기와 함께 연기한 그 캐릭터들의 주도성은 가히 눈이 부실만했다.
클로즈업서 빛나는 입체적 연기력
지금 이 순간 그간 간과되거나 홀대됐던, 이화와 선영 사이의 강렬한 캐릭터를 호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캐릭터 이름이 제목인, 김기영 감독의 ‘느미’(1979)다. 한국영화사 최대 ‘괴짜 감독’의 걸작들 ‘하녀’(1960) ‘이어도’(1977) 등에 가려, 상대적으로 덜 조명된 수작. 영화에서 장미희는 사랑에 헌신하는 비운의 벙어리 느미로, 이화나 선영, 제인과는 또 다른 폭과 깊이의 강력한 열연을 선보인다. 그 발군의 호연으로 장미희는 80년 제1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영평상) 여자연기상을 거머쥐었다. 대사 없는 소리와 표정, 몸짓 연기로, 대한민국 대표 영화평론가 조직에서 수여하는 연기상을 안았다는 사실은 장미희가 얼마나 뛰어난 배우인지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라 할 수 있다.
느미의 연기는 배창호 감독의 저주받은 수작 ‘황진이’의 진이로 직결된다. 한때 짝사랑을 참다못해 공개 청혼까지 감행했던 감독 배창호가 장미희에게 바치는 헌사! 영화에서 그녀는 느미와는 또 다른 차원의, 이미지로서 연기의 절정을 보여준다. 영화는 단적으로 정중동의 미학을 뽐내는 바, 진이 캐릭터도 그렇고 장미희의 인물 해석 역시 그 미학을 현실화시킨다. 장미희가 아니라면 불가능했을 입체적 섬세함과 정치함으로.
영화는 흔히 클로즈업의 매체로 간주돼왔다. 고로 연기를 잘하고 못 하고는 해당 배우가 과연 영화의 클로즈업을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내느냐 여부에 의해 판단되기 십상이다. ‘황진이’에서 장미희는, 감독의 사적 애정이 가득 담긴 숱한 클로즈업들을 설득력 풍성한 타당성으로 승화시키는 데 성공한다. 내가 기억하는 가장 인상적인 클로즈업 영화는 이안 감독의 ‘와호장룡’(2000)과 이병헌 주연의 ‘달콤한 인생’(2005)인데, ‘황진이’는 그 위상을 탈취한다. 빈말이 아니라 장미희는 클로즈업 연기에서 장쯔이와 이병헌을 압도한다. 내 생애 ‘황진이’ 같은 명품 클로즈업 영화와 또다시 조우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다.
김호선 감독의 ‘사의 찬미’는 어떤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성악가였던 윤심덕을 축으로 펼쳐지는 수작 전기 드라마. 20년대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성도 놓치지 않은 영화에서 장미희는 윤심덕의 현현이라는 평가가 과언이 아닐, 실감 연기를 만끽시켜준다. 도입 및 발단·전개부에서의 노래 시퀀스에서 입과 노래가 따로 놀아 적잖이 거슬리긴 해도, 오페라 ‘나비부인’ 시퀀스와 그 이후로는 줄곧 최강도 영화 감상의 맛을 안겨준다. 드라마틱한 극 중 사연과 함께, 거의 완벽한 립싱크로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 문희 신성일 주연의 ‘윤심덕’(안현철·1969)과 비교하는 맛이 여간 짙지 않을진대, 시대성이나 인물의 역사성을 거의 삭제시켜 버린 선배작이 안쓰러울 지경이라면 짐작이 갈까. 장미희는 ‘사의 찬미’로 91년 제12회 청룡영화상과 2회 춘사영화상, 92년 30회 대종상과 39회 아시아·태평양영화제 여우주연상 등을 휩쓸었다. ‘겨울여자’의 이화로부터 14년이란 세월의 연륜을 쌓은 성숙할 대로 성숙한 연기로. ‘길소뜸’과 ‘티켓’의 김지미가 연상되는 것은 그래서다.
이쯤 되면 장미희 그녀에 관한 다른 이야기나, 논란의 여지가 적잖은 여타 개인사들에 대해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전찬일 영화평론가·한국문화콘텐츠비평협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