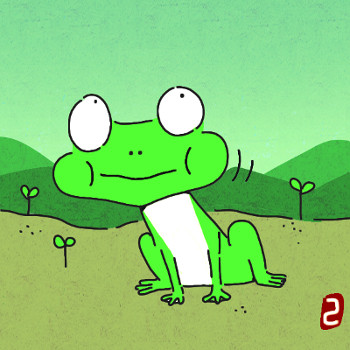
글피(6일)가 경칩(驚蟄)이지요. 말이 놀라 뛰는 驚에 벌레가 꼼짝 않고 있는 蟄으로 된 말입니다. 개구리나 벌레 등이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때이지요.
이맘때 일어나 자리를 터는 ‘개구리’는 원래 ‘머구리’였습니다. 1481년 출간된 ‘두시언해’에 나오며, 1527년 간행된 ‘훈몽자회’에 蛙를 ‘머구리 와’라고 풀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17세기 들어 ‘개고리’로 변해 쓰였는데, 개구리가 된 것은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왜 ‘머구리’ ‘개고리’라고 했을까요. 우리말의 빼어난 의성어 창조성에 답이 있겠는데, ‘맴맴’ 시절 좋게 노래하는 매미나 ‘뻐꾹뻐꾹’ 우는, 남의 집에 몰래 알을 낳아 새끼를 거저 키우는(托卵, 탁란) 밉상 뻐꾸기처럼 그 울음소리가 이름이 된 게 많지요. ‘개골개골 개구리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이런 동요도 있듯 옛사람들 귀에 개구리가 ‘머굴머굴’ ‘개골개골’ 우는 것으로 들렸던 겁니다. 여기에 명사형을 만드는 ‘이’가 붙어 머구리, 개고리로 연음됐지요.
개구리 같은 것을 양서류(兩棲類)라고 하는데 뭍에서도 물에서도, 즉 ‘양쪽에서 서식(棲息)한다’는 뜻입니다.
‘우수, 경칩 지나면 대동강 물도 풀린다.’ 세상사 때가 되면 자연스레 해소된다는 의미이지요. 그렇다고 마냥 퍼질러 앉아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서완식 어문팀장
삽화=전진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