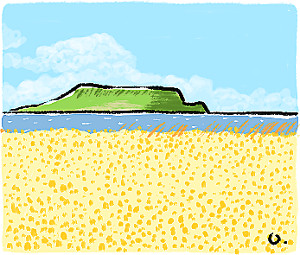
서울 토박이인 내가 주기적으로 찾는 곳은 제주다. 제주의 모든 계절과 자연의 흐름에 빠져 삶의 고단함이나 피로감이 쌓일 때면 제주로 가서 살까 하는 말풍선 같은 생각을 하곤 한다. 제주에 살고 있는 지인들로부터 낭만적인 생각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들어 잘 알고 있지만 제주의 자기장이 나를 주기적으로 끌어당기고 있다. 작년 4월, 심신이 지치고 의욕이 없을 때 제주로 떠나 무작정 돌아다닌 적이 있다. 동이 틀 무렵 함덕 서우봉을 혼자 올라가면서 철지난 유행가들을 부르다 맞닥뜨린 작은 봉분들과 언덕 위 무덤들, 그리고 그 사이 사이 피어 있는 이름 모를 풀꽃들. 어쩐 일인지 무덤가 둘레를 도는 아저씨 한 분이 있었고, 그분이 사라지자 나 역시 무덤가를 몇 바퀴 돌고 내려왔다. 내려오는 길에 목덜미의 서늘함을 자주 느꼈는데 뒤들 돌아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이어져 서울로 돌아와서도 어둑어둑한 곶자왈을 헤매는 꿈을 꾸기도 했다.
내가 본 무덤들이 4·3 사건과 연관이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최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 상영되는 임흥순 작가의 ‘우리를 갈라놓는 것들’을 보면서 다시금 그 시간과 꿈속의 장면을 떠올리게 되었다. 4·3 사건을 경험한 할머니들의 삶의 공간과 사물들을 전시장에 옮겨놓고 시공간, 현실과 환상이 뒤섞인 이미지를 상영하고 있다. 전시와 함께 뒤늦게 본 영화 ‘비념’은 4·3 사건과 강정 해군기지에 대한 두 개의 사건을 중첩, 충돌시키면서 상처와 고통, 그리고 침묵의 시간들을 파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임흥순 작가 특유의 형식미가 작품에 의도적으로 들어가 있었겠지만 갑자기 멈추고, 뚝뚝 끊어지고, 거칠게 이어지는 영상의 흐름과 공백 사이 사이에서 문득 문득 얼굴 없고 이름 없는 유령들을 본 것만 같다. 아니 보았다. 어떤 영화들은 유령들을 지금 이곳으로 불어오는 주술의 매체 역할을 한다. 올해는 4·3 사건 70주년이라는 기사와 현수막이 곳곳에서 보인다. 유령들이 얼굴을 얻고 이름을 얻어 신체를 갖게 될 수 있을까.
김태용(소설가·서울예대 교수)
삽화=공희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