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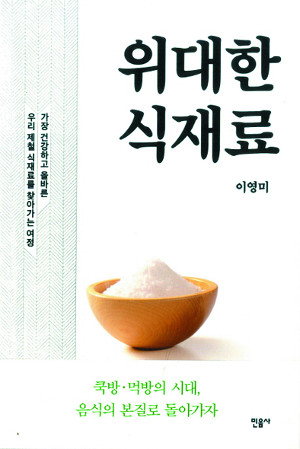
책은 ‘먹방(먹는 방송)’과 짝한 요리책의 변천사로 시작된다. 1970년대 TV 프로그램은 하선정과 같은 유명 요리연구가의 강습이 주였다. 80년대에는 맛집을 찾아다니는 프로가 나왔다. 책도 레시피 위주에서 ‘맛집’을 돌아다니는 에세이로 변했다. 90년대는 온갖 음식 소개가 난무하면서 ‘TV에 방영된 집’이란 광고가 전국 곳곳에 걸렸다.
2000년대 들어 요리 달인을 소재로 한 드라마 ‘대장금’(2003) 등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책도 맛집과 요리 전문가를 찾아다니는 만화 ‘식객’(2002)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2010년대는 스타 셰프를 앞세운 요리 대결 프로 ‘냉장고를 부탁해’(2014)나 해외여행지에서 식당 영업을 하는 ‘윤식당’(2017) 등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책은 여행과 음식을 결합한 ‘맛집 기행’이 대세다.
‘위대한 식재료’는 맛집을 찾아다니며 쓴 에세이의 궁극이라 불릴 만하다. 음식의 기초 중에 기초인 식재료와 그 명인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찾은 기행문이다. 소금·쌀·장(醬)에서 야채 축산물 해산물 과일에 이르기까지 철마다 맛과 향, 영양이 가장 풍부한 식재료 18가지를 찾는다.
산지에서 생산자를 만나서 보고 들은 얘기를 쓴 ‘생생’ 취재기다. 저자 이력도 심상찮다. 이영미(57)는 ‘서태지와 꽃다지’ 등을 쓴 1세대 대중예술 연구자로 조부모와 부친이 북한 개성 출신이다. 어머니는 전라도에서 태어났다. 경남 출신의 남편을 만나 팔도 음식에 대한 감각을 익혔다. 30대 중반부터 경기도 이천에 살며 텃밭을 가꾸고 제철 음식을 해 먹었다.
첫 식재료 소금 편만 봐도 이 책의 묘미를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다. 최고의 천일염을 찾아 전남 신안까지 내려간다. 소금을 긁으려면 지금처럼 사흘 연속 해가 쨍쨍 나는 여름이어야 했다. 그러나 하필 그해 8월은 비가 오락가락해 날짜를 잡는 것이 ‘임금님 혼인날’ 잡는 것보다 힘들었다고 한다. 애태운 끝에 흙으로 된 염전에서 ‘토판염’을 긁어내는 장면을 본다. 대개 우리가 먹는 장판염은 비닐 장판을 깔아 생산한 것이다. 자연적인 환경에서 생산된 토판염은 장판염에 비해 짠맛이 빨리 사라지면서 뒤끝이 달착지근하다. 국내 1300여개 염전 중 이렇게 소금을 생산하는 곳은 딱 10곳에 불과하단다.
저자는 소금 결정이 잠자리처럼 날개를 펴는 것을 목격하는 행운도 누린다. 이 소금은 해와 기온과 바람이 맞아야 나타나기 때문에 염전 주인은 이걸 ‘바람꽃 소금’이라고 부른다. 굵거나 고운 것으로 소금이 나뉘는 줄 알았던 사람에겐 신선한 충격이다.
쌀은 어디가 최고일까. 상수도 보호 구역을 낀 경기도 양평은 농약을 뿌리지 않고 키운 벼가 많이 생산된다. 저자는 양평 쌀을 사 먹다 경북 문경 희양산 아래에서 농사짓는 후배의 쌀을 먹게 된다. 문경에 가보니 어느 논이나 메뚜기가 천지였다. 농약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그 동네에서는 메뚜기 장조림이 군침을 돌게 한다. 멸치 축제가 열리는 부산 기장에서 멸치 회 무침을 먹고선 그저 하늘과 바다가 고맙다며 감동한다.
채소는 경기도 남양주로 가서 구한다. 그런데 여기에선 서울시에 마음 상했던 농부들을 만난다. 상수원을 보호한다고 유기농 채소를 키우라고 하고선 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좋은 식재료가 나오려면 그런 식재료를 찾는 소비자가 필요하다”는 상식과 “하늘, 땅, 바다가 인간에게 먹거리를 내려줘야 인간이 산다”는 진리를 배운다.
먹기만 하는 내게 이런 지식이 어디에 소용될 건가 싶기도 하지만 매일 먹는 식재료의 가장 좋은 기준을 알아가는 게 나름 뿌듯하고, 식재료에 얽힌 다양한 얘기들이 상당히 재미있다. 식재료를 구하는 정보도 상세히 안내돼 마음만 먹으면 최고의 신토불이(身土不二) 재료를 당장 식탁에 올리는 호사를 누릴 수 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