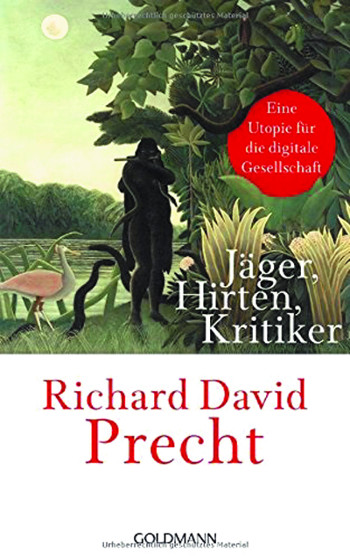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전망했던 미래 세계는 생산한 재화를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정해진 근로 시간 동안 저마다 여러 가지 일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세계였다. 그런 사회에서는 아침에 사냥하고 낮에는 가축을 몰며 저녁에는 비평을 하는 삶이 가능할 것이다. 굳이 전업 사냥꾼이나 목자, 비평가가 되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런 삶 말이다. 마르크스는 이처럼 자기실현적이고 자유롭게 선택한 노동을 ‘노동의 이상적 모습’이라고 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사회주의적 유토피아의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 그러나 현재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철학자 중 한 명인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히트는 신작 ‘사냥꾼, 목자, 비평가’에서 아직 ‘잠재된 가능성’일 뿐이라고 진단한다. 저자는 고삐가 풀린 채 질주하는 기술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한다. 기술 지상주의자들이 열광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우리 미래의 삶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며, 비관론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디지털 기술이 필연적인 파국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한다.
저자는 기술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않으며, 기술사회의 핵심은 ‘문화’에 있다고 주장한다. 디지털 기술이 가진 위험성을 인지하고, 기술의 올바른 쓰임새를 결정하는 것이 문화임을 강조한다. 이 책은 인터넷으로 인한 사적인 공간의 소멸, 자동화에 따른 대량실업, 디지털 사회에서의 권력과 부의 집중, 가상화폐처럼 통제할 수 없는 기술들이 등장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기술사회의 본질적인 의미를 되묻고 있다.
베를린=김상국 통신원(베를린자유대학 연구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