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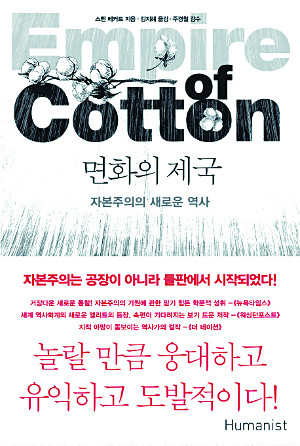
세 번째 챕터가 시작되는 111쪽의 첫 문장은 이렇다. “혁명은 뜻밖의 장소, 맨체스터 변두리의 나지막한 언덕에 위치한 조용한 계곡에서 시작되었다.”
이 혁명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 눈치 빠른 독자라면 영국 맨체스터라는 지명만으로도 그것이 산업혁명일 거라고 넘겨짚을 수 있을 것이다. 1784년 맨체스터에서는 한 남자가 물의 낙차를 이용해 방적기를 돌렸는데,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인력(人力)이 아닌 다른 무언가의 힘이 면사를 생산해낸 순간이었다. 작은 농촌 마을이던 맨체스터엔 잇달아 공장이 들어섰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지금의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그 시절 맨체스터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지역으로 거듭났다. 지구촌에서 가장 산업화된 도시로 성장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왜 산업혁명의 땔감이 됐던 건 쌀이나 밀이나 담배나 사탕수수가 아닌 면화였던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면직물 산업이 11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제조업이었다는 데 있다.
물론 지금도 이 산업은 제조업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면직물이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힘들다. 2013년 기준 세계 각국에서 생산한 면화를 합치면 180㎏ 꾸러미로 1억3000만개에 달한다. 지구촌 모든 사람에게 티셔츠를 20장씩 만들어줄 수 있는 양이다.
눈길을 끄는 건 과거엔 이 산업이 지금보다 훨씬 중요했다는 것이다. 면화는 지금의 자본주의를 만드는 데 사용된 팔레트였다고 할 수 있다. 면화를 기르는 경작지와 면화에서 실을 뽑아내 옷감을 짜는 공장은 대규모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키워낸 요람 역할을 했다. 노예제나 임금노동, 보험을 비롯한 각종 금융 상품들 역시 면화의 피조물이었다.
스벤 베커트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펴낸 ‘면화의 제국’은 이렇듯 장구한 인류의 역사에 넓게 새겨진 면화의 무늬를 확인하게 만드는 작품이다. 자본주의의 기원을 파헤친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띠지엔 이렇게 적혀 있다. “자본주의는 공장이 아니라 들판에서 시작되었다.”
즉, 지금의 자본주의는 산업혁명 이전에 면직물 시장이 지구촌 무역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면화가 중요한 상품으로 거래될 때 시작됐다는 것이다. 저자는 인간이 언제 면화를 경작하기 시작했으며, 면화가 지닌 특성은 무엇인지 들려준다. 독자들은 이를 통해 ‘면화의 제국’이라는 가상의 국가가 걸어온 흥망성쇠의 스토리와 자본주의의 기원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자는 “면화는 연금술에 가까운 비술을 동원해 노예제와 자유노동, 국가와 시장, 식민주의와 자유무역, 산업화와 탈산업화 등 상반된 듯이 보이는 것들을 결합시켜 부로 변환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인류 역사에서 면화가 지닌 의미를 모르거나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빚어지는 건 “탄광이나 철도, 거대한 제철소처럼 산업자본주의를 더 확실히 보여주는 직접적인 이미지들에 가려져 면화가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의 자본주의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을 먹고 자란 야멸찬 메커니즘이다. 특히 저자는 면화 시장 탓에 전쟁자본주의가 발흥해 인류의 역사에 적잖은 얼룩을 남겼다고 적었다. 그렇다면 전쟁자본주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제국의 팽창+원주민 약탈+노예제’를 근간으로 하는 시스템이다. 15세기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비슷한 시기에 바스코 다 가마가 유럽과 인도 사이를 오가는 항로를 개척한 게 전쟁자본주의의 시작이었다.
유럽은 전쟁자본주의를 통해 세상의 조종간을 잡을 수 있었다. 유럽인이 다른 대륙 사람들보다 똑똑해서, 혹은 탁월한 어떤 제도를 갖췄기에 유럽이 지구촌의 일등 대륙으로 성장한 게 아니라는 얘기다. 유럽은 춥고 습도가 높아서 면화를 재배할 수 없는 땅이었지만 유럽인에겐 막강한 파워가 있었다. 이들은 무력을 앞세워 무역망을 짰고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했다. “면화 무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재편하고 지배하는 능력”이 유럽의 힘을 배가시킨 셈이다.
노예제 역시 면화를 먹고 자란 제도였다. 예컨대 1830년 미국에서 면화 재배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100만명에 달했는데, 대다수가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노예였다. 저자는 “면화의 제국 안에서 노예제가 머나먼 초신성처럼 소멸되고 나서는 산업자본주의를 건설하는 데 노예제가 했던 결정적 공헌이 우리의 집단 기억에서 사라졌다”고 지적한다.
800쪽 넘는 분량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이 책에 담긴 내용은 방대하다. 동어반복 수준이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 적지 않지만, 자본주의 역사를 다룬 여타의 책에선 짚지 못했던 색다른 포인트가 곳곳에 등장한다. 조금 과장하자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면화 재배나 면직물 생산에 여성이 기여한 부분을 상술하거나 면화의 제국이 구축되는 데 ‘국가’의 역할이 얼마나 지대했는지 살핀 내용도 주목할 만하다. 특정 국가의 역사에 매몰되지 않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계사의 흐름을 살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이 책에 대한 소개는 책의 들머리에 담긴 이런 문구로 갈음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다루는 것은 한때 유럽이 지배했던 면화 제국의 흥망성쇠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면화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그것은 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자본주의의 형성과 재편에 관한 이야기이자, 그에 따른 근대 세계의 형성과 재편에 관한 이야기이다. …우리는 어떻게 그토록 짧은 기간 안에 유럽의 진취적인 기업가와 유력 정치인들이 제국의 팽창과 노예노동에 새로운 기계와 임금노동자를 결합시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제조업을 창조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