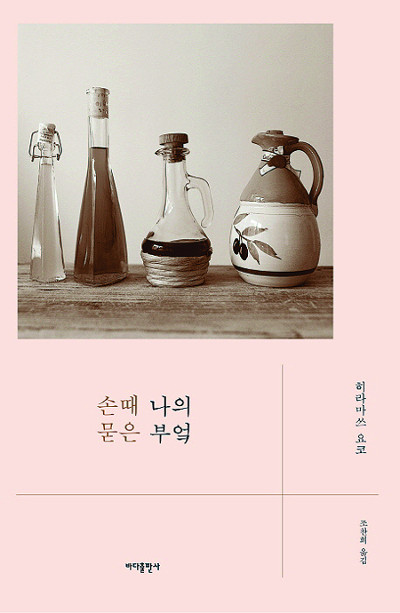
저자는 일본의 맛 칼럼니스트다. 그는 이 책 ‘손때 묻은 나의 부엌’에서 온갖 추억이 깃든 자신의 갖가지 조리 도구를 하나씩 소개하면서 맛깔나는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무엇보다 필력이 보통이 아니다. 도마를 소재로 써 내려간 글을 보자. 그는 오랫동안 편백나무 도마만 썼다. 그러던 어느 날 만난 ‘은행나무 장인’으로부터 이런 조언을 듣게 된다.
“은행나무의 나뭇결은 유분을 촘촘히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부엌에서 쓰기에 제격이죠. 물이 스며들지 않거든요. 게다가 뭐니 뭐니 해도 가볍습니다.”
실제로 은행나무 도마의 촉감은 부드러웠고, 사용해보니 놀라운 구석이 많았다. “표면이 지방질을 듬뿍 머금고 있어서 점벙점벙 씻어도 물기가 매우 잘 말랐다.” 칼과의 궁합도 훌륭했다. 그런데 이야기는 은행나무 도마를 예찬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저자는 이제는 어사무사해진 유년기의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린다. 어린 시절 은행나무 아래 철봉에 매달려 서럽게 울던 시간, 높이뛰기 선수로 뽑힌 게 싫어서 은행나무 그늘에 숨어 있던 날들….
어쩌면 특별할 게 없는 책이다. 평범하다고, 얼마간 얄팍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책장 곳곳엔 분명 따뜻한 훈김이 서려 있다.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 같은 책이라고나 할까.
부엌을 향한 저자의 사랑 고백은 이제는 보통명사처럼 쓰이는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의 참뜻을 실감하게 만든다. 가령 첫 챕터를 장식하는 내용은 저자가 25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양철 쌀통 이야기. 그는 추억담을 늘어놓으면서 이렇게 적었다.
“쌀통 바닥이 보이면 마음 한 편이 적적해진다. 안 그래도 바람 불면 날아갈 듯 가벼운 양철인데, 쌀이 줄면 더욱 처량해 보여서 그걸 보는 나 또한 맥이 풀린다. 바로 이럴 때다. 쌀통 안에 든 쌀알 한 톨 한 톨이 내 살림을 지탱해 주는구나, 깨닫는 때가.”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