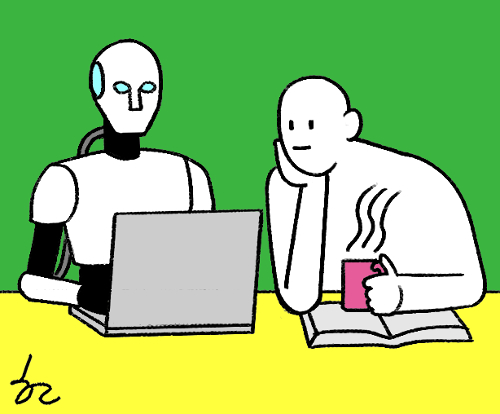
19세기 초 영국의 직물공업지대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공장의 기계를 파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자동화된 직물 기계 도입으로 일자리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이 주도한 러다이트운동이다. 기계화·자동화와 기존 노동자와의 갈등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진행형이다. 현금인출기가 설치되고 온라인·모바일 뱅킹이 확산되자 은행 창구 일자리는 쪼그라들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징수원들은 하이패스 설치로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자율주행이 보편화되면 운전으로 먹고사는 사람들도 온전할 리 없다. 이코노미스트의 글로벌 경제 전담 기자인 라이언 아벤트는 ‘노동의 미래’로 번역된 저서(The Wealth of Humans, 2016)에서 “현재의 일자리는 30년 내로 소멸한다”고 예언했는데 엄포로만 들리지 않는다.
물론 낙관적인 전망도 있다. 세 차례 산업혁명 이후 기존 일자리가 줄었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 총량적으로는 일자리가 늘었다는 경험이 근거다. 그러나 로봇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이 이끌 4차 산업혁명은 다른 양상을 보일지 모른다. AI 등이 고도화돼 대체 가능한 인간 노동의 영역이 상상 외로 넓어지면 생산 분야에서 인간의 역할은 대폭 축소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들어맞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다수 인간은 노동력 제공 차원에서는 쓸모없는 ‘잉여인간’이 된다. 지금과 같은 노동시장 시스템이라면 이들은 임금 소득이 없어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이들도 문제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소비여력이 떨어지니 기업도 제품과 서비스를 팔아 이윤을 남기는 게 어려워진다. 그런 사회, 그런 경제는 암울하다. 도덕적 해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본소득이 대안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는 스웨덴 정부가 추진하는 ‘잉여인간 일자리’ 프로젝트를 보도했다. 2026년 스웨덴 남서부 한 도시에 역이 하나 완공되는데 한 해 전에 전 세계 공모를 통해 이곳에서 일할 종신직 직원 1명을 뽑을 예정이란다. 출퇴근시간만 지키면 되는 조건이다. 책을 읽든, TV를 보든, 잠을 자든 상관하지 않고 급여를 주겠다니 환상의 일자리다. 이런 황당한 프로젝트를 생각한 건 대규모 자동화와 AI 시대의 인간과 노동에 대한 고민거리를 던져보기 위해서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의 존재가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면 노동의 의미도 지금과는 달리 설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동철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