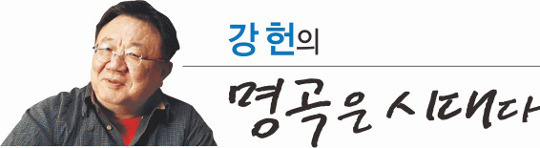


고작 열다섯 살 소녀 권보아가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2000년에 데뷔 앨범을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세계시장 진출용 비밀병기’라는 홍보 콘셉트는 허풍처럼 들렸다. SM의 간판 작곡가 유영진을 비롯해 박진영과 방시혁 등이 참여했지만 여성 솔로라는 포맷은 소녀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보이그룹의 아성을 위협하기는 아무래도 힘들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넘사벽’ 일본 시장에 도전하다
1996년 5인조 보이그룹 H.O.T.의 폭발적인 성공으로 파산의 위기에서 탈출한 SM은 세기말 H.O.T.와 짝을 이루는 걸그룹 S.E.S.를 시장에 연착륙시키며 한국의 대표적인 기획사로 부상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함께 내수시장은 무너지게 된다. SM의 수장인 이수만은 자신의 생애를 베팅하는 세계시장 진출을 설계한다.
H.O.T.가 한국 드라마 붐에 힘입어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공연을 성공시키고 S.E.S.가 대만 시장에 약간의 붐을 일으켰다고는 해도, 불법 복제가 횡행하고 저작권 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중국 시장은 미래가치만 무성할 시장일 뿐이었다. 중국은 빛 좋은 개살구나 진배없었다. 20년 뒤의 대한민국에서는 코웃음 나올 얘기지만 미국이나 유럽 시장도 언감생심이었다. 그리고 세계 2위의 음반시장을 보유한 일본 시장은 ‘넘사벽’이나 마찬가지였다.
한국 가수의 해외 진출은 한류 이전에도 존재했다. 트로트의 전설인 이난영의 두 딸과 이난영의 조카로 이뤄진 김시스터스는 62년 미국 CBS의 ‘에드 설리번 쇼’에 출연해 코스터스의 ‘찰리 브라운’을 리메이크한 노래로 미국 시장에 도전했다. 이들의 에드 설리번 쇼 공연 실황은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이들은 보컬 그룹으로서의 완벽한 하모니는 물론, 20여개의 악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놀라운 개인기로 미국의 청중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오리지널리티를 가지지 못한 이들이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라스베이거스 쇼 무대까지였다. 메이저 음반 시장에 도전하기엔 진입장벽이 너무 높았다. 미8군의 후배 패티김 또한 수차례 미국의 벽을 두드렸지만 그녀 역시 라스베이거스에서 꿈이 멈췄다.
엔카와 트로트라는 같은 뿌리를 공유하고 있는 일본은 사정이 달랐다. 일본의 프로모터들은 60년대 엔카의 초절정기를 담당한 슈퍼스타 중 상당수가 재일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들은 이미자 나훈아 등 한국 스타들의 가능성을 타진하곤 했다. 그러나 언어의 장벽이 문제였다. 일본어 버전 음반을 내는 것까지는 가능했지만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모국어 수준의 일본어 구사가 필수적이었다. 이 문제는 이들의 일본 진출을 가로막았다.
이미자를 위시한 한국의 스타들은 반일 감정 때문에 조국으로부터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했다. 무엇보다 불확실한 시장에 미래를 걸 이유가 없었다. 물론 과감하게 현지화 전략을 채택한 가수도 있었다. 70년대 일본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이성애를 필두로 80년대에는 계은숙과 김연자가 일본에 진출했다. 조용필은 일본 시장에서만 골드 레코드를 3장이나 기록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과들은 마이너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던 엔카 시장에 국한돼 있었다.
80년대와 90년대 일본의 J팝은 엄청난 속도로 확장되고 있었다. 이들의 감수성은 더 이상 극동 아시아에 머무는 것을 거부했다. 일본은 영국마저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음반 산업 강국으로 부상했다. 서구의 톱 뮤지션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일본에 와서 프로모션을 하고 콘서트를 열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아이돌 문화를 수입하고 자신들의 음악을 비도덕적으로 표절하는 이웃나라 한국의 음악문화에 관심을 가질 일본인은 있을 리가 없었다.
이수만은 바로 이 일본 시장에 도전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에겐 힘이 없었다. 철저히 일본 시장이 요구하는 현지화를 받아들이는 굴욕을 감수했다. 그는 열두 살 소녀 권보아를 발탁해 일본어와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무장시켰다. 노래, 춤, 연기, 방송 진행 등 모든 분야의 프로페셔널리즘을 이 소녀에게 주입시켰다. 그리고 당시 일본 최고의 엔터테이너 아무로 나미에를 보유한 에이벡스와 계약을 맺어 에이벡스 소속 가수로 일본 시장에 출격시킨다.
K팝 세계화의 시작
보아의 첫 활동은 음악 분야가 아니었다. 기린 음료의 CF 모델과 라디오 방송 DJ였다. 대다수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뮤지션으로서 보아가 성공을 거두는 데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녀는 단박에 성공을 거둔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전사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보아의 노래는 그리 큰 반응을 얻어내지 못했다.
그런데 일본 활동을 접고 국내로 복귀하려던 2002년 초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해 1월 발표한 ‘리슨 투 마이 하트(Listen to My Heart)’가 일본의 빌보드 차트 격인 오리콘 차트에서 발매 당일 5위에 진입했고, 두 달 뒤 발표한 동명의 앨범이 사상 최초로 차트 1위에 오르게 된다. 음반은 밀리언셀러가 됐다. 당연히 이 기록은 한국 가수 최초이다.
새로운 밀레니엄의 원년인 2000년, 열다섯 살에 데뷔한 이 소녀는 이렇게 한국 대중음악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꾼다. 그리고 그 순간은 TV 드라마로 일기 시작한 한류가 음악 부문에도 본격적으로 점화되는 가슴 뭉클한 장면이 됐다. 한국의 대중음악은 비좁은 한반도 남녘을 벗어나 글로벌 스탠더드의 한 축으로 도약하는 기념비적 순간을 맞게 된다.
보아는 21세기 첫 10년을 대표하는 단 한 명의 영웅이자 동시에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R&B에 기반을 둔 다채로운 음악 장르를 혼합한, 어번(Urban) 스타일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뛰어난 보컬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여기에 춤 실력을 비롯해 화려한 비주얼적 능력을 겸비했다. 2003년 내놓은 두 번째 앨범 ‘발렌티(Valenti)’는 발매 당일 100만장이 팔리며 신드롬을 일으켰다. 이후 보아는 무려 7장의 앨범을 차트 정상에 연속적으로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일본 시장에서 여가수 역사상 두 번째에 해당하는 놀라운 기록이다. 그리고 2009년 미국에 진출한 보아는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에서 127위를 기록하게 된다.
보아의 노래들은 오로지 한국인의 감성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니었다. 데뷔 앨범에는 SM의 간판 작곡가 유영진을 비롯해 이현정과 김형석 등 국내 작곡가들이 가담했지만, 일본 진출 이후 앨범들에는 한국 일본 유럽 미국의 작곡가들이 두루 참여했다. 성숙한 여인의 향기를 물씬 뿜어낸 앨범 ‘허리케인 비너스(Hurricane Venus)’(2010)만 해도 댄스팝 넘버들은 외국 작곡가들, 김동률을 위시한 국내 작곡가들, 보아 본인의 작품들로 구성돼 있다.
보아가 김추자와 한영애 혹은 박정현과 같은 디바들이 지닌 본능적이고 원시적인 가창의 생명력을 가졌다고 보긴 어렵다. 하지만 그(와 그의 기획사)는 ‘메이드 인 코리아’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재능의 요소들을 필사적으로 탑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방법론의 길을 열었다. 그의 승리는 따라서 SM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이수만이 H.O.T를 통해 아무런 저작권 보호를 기대할 수 없었던 중국 시장에 도전장을 던질 때만 해도 한국 대중음악의 해외 진출은 그저 반짝 트렌드 상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위험이 다분했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이 명민한 프로듀서는 처음부터 현지화 전략을 가동할 수 있는 가수를 기획했고, 보아는 그 희망에 대한 최선의 응답이었다.
2002년, 월드컵 4강의 기적과 노무현이라는 언더독의 반란이 불꽃처럼 일어난 그 해에 보아가 데뷔 앨범의 여세를 몰아 발표한 ‘No.1’은 노르웨이 출신의 작곡가 지기(Ziggy)의 작품이었다. 한국과 일본 양국 시장에서 제목처럼 정상에 오르며 보아의 권능을 완벽하게 증빙한 그의 대표작 중 하나다. 그는 이 노래에서 그 이전의 한국 여성 보컬리스트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댄서블한 리듬 감각과 확고한 보컬 장악 능력을 유려하게 보여준다.
보아의 미국 상륙작전은 아쉽게도 실패했다. 그의 마지막 과제는 싸이와 방탄소년단이 10년쯤 후에 해결해 줄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를 기준으로 한국 대중음악의 전후사가 새로 쓰였다는 건 틀린 말이 아니다. 보아가 보낸 첫 10년은 K팝 세계화의 10년이었다. 그 덕분에 동방신기와 소녀시대 같은 아이돌 그룹이 아시아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는 바탕이 성숙하게 구축될 수 있었다.
<강헌 음악평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