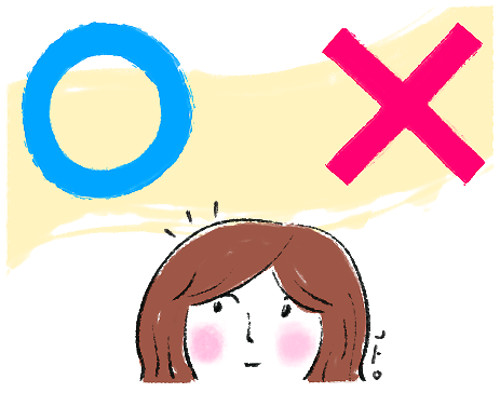
대학원 시절, 조교로 사무실에 근무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전화가 종종 걸려왔다. 국문과 사무실이었던지라 맞춤법이나 단어는 기본이고 고사성어나 속담을 물어오는 사람도 있었다. 이야기하다 서로 의견이 엇갈려 언쟁이 벌어지면 맞는 답을 찾기 위해 관련된 곳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물론 그냥 궁금해서 전화를 건 사람도 있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서로 언쟁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자신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틀렸다고 말을 하면 답답하기 마련이다. 퇴근 무렵 전화를 걸어 다급하게 ‘배나무밭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가 한자로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분도 기억에 남는다. 요즘에는 이런 전화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검색을 바로 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아이와 스티븐 호킹 박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55년 동안 루게릭병에 걸려 병마와 싸웠던 그는 2018년에 사망했다. 아이가 스티븐 호킹 박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말을 했다. 처음 듣는 소리에 나는 의아했다. 갸우뚱하는 내 표정을 보더니 아이가 덧붙인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신문기사가 났어요. 루게릭병을 피해 이겨냈던 스티븐 호킹이 자동차는 피하지 못했다는 기사가요.” 아이가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하니 정말 그런가보다 싶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검색을 해보니 자택에서 사망했다. 이상하다면서 아이는 정말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고 말을 했다. 확신에 찬 아이에게 잘못 볼 수도 있으며 내가 알고 있는 게 다 맞는 건 아니라고 차분하게 말해주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누구나 틀릴 수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은 그래서 중요하다. 이런 태도를 지녀야만 진심으로 겸손해질 수 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들을 보다 보면 사실을 왜곡하여 받아들이거나 통념에 휘둘릴 수 있다.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 단정적으로 판단하거나 편견을 가질 수도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사실이 정말 맞는지, 자신의 판단이 과연 옳은 것인지 살펴보는 일은 중요하다. 이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오류에 빠져 있는 시간은 더 길어진다.
문화라 작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