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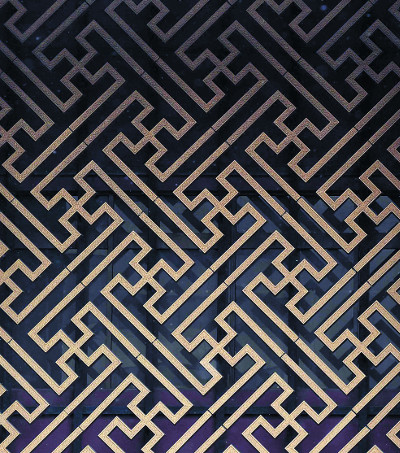
“엄 선생, 세종문화회관에 북한처럼 기와와 서까래를 씌우지그래. 평양에선 큰 건 다 기와를 씌우고 하니 말이야.”
1973년, 1974년 무렵의 일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세종문화회관 설계 공모에 당선된 뒤 부족한 예산 탓에 씨름 중이던 엄덕문(1919~2012) 건축가를 청와대로 불러들이더니 이같이 말했다. 평양대극장(1960년 준공), 인민문화궁전(1974년 준공) 등 한옥 지붕 형태를 띤 평양의 대규모 문화시설을 거론하며 세종문화회관의 설계를 변경하라는 날벼락 같은 지시를 한 것이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은 흥미로운 공간이다. 왕조시대의 건축물인 경복궁이 보이는가 하면 사직로를 건너기만 해도 1970년대 산업화 시대의 건축물이 즐비하다. 74년 들어선 세종문화회관도 그런 곳이다. 개발바람에 사라지지 않은 채 지금도 거기 있기에 부재에서 오는 레트로 감성을 자극하지 못할 뿐이다. 88년 서초구에 예술의전당 음악당이 개관하기 전까지 10여년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연장 역할을 한 세종문화회관은 남북 간 체제 경쟁과 대화의 산물로 탄생했다. 그 시절 남북은 군사력·경제력에서 대결했지만 문화적 능력을 두고도 경쟁했다. 그것을 21세기인 지금, 일상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세종문화회관이다.
남한 최대의 문화시설
72년 7월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됐다. 남북이 분단 27년 만에 처음으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을 공식 천명했다. 이를 위해 앞서 5월에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을 비밀리에 방문하고 온 터였다. 해빙 무드는 엉뚱하게 남북 간 문화적 경쟁심을 촉발시켰다.
엄덕문 건축가의 구술 채록 작업을 했던 안창모 경기대 교수는 “체제 경쟁에서 중요한 건 민족 정통성을 누가 차지하느냐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민족문화의 보호와 육성에 대해 말은 많이 했지만 실천에 옮긴 프로젝트는 거의 없었다. 먹고살기 힘들어서 경제 성장에 올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북 대화를 하고 보니 평양은 평양대극장, 옥류관(1960년 준공) 등 전통 건축 양식 그대로 굉장히 잘 지은 건축물을 시내 곳곳에 갖고 있었다. 남한에서도 보여줄 뭔가가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마침 1972년 12월 서울시민회관이 불타 없어졌고, 그 자리에 북한에 버금가는 문화시설을 짓고자 했던 것”이라고 해석했다.
엄덕문은 세종문화회관 공모에서 1등과 2등을 모두 차지했던 인물이다. 그는 대통령 앞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고 구술집에서 밝혔다.
“기와만이 한국적인 것은 아니다. 평양은 평양대로의 스타일이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의 문화와 창조의 세계가 있다. 우리의 것을 창조하는 것이 평양보다 한 수 위가 되면 되는 것”이라고 대통령을 설득했다. 그가 말하는 우리 스타일은 전통과 기능의 조화, 즉 전통의 현대화에 있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이 북한과 문화 경쟁을 벌인 점은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규모를 5000석으로 늘리라고 요구한 데서도 드러난다. 평양 2·8문화회관(75년 개관·현 4·25문화회관)이 6000석 규모임을 의식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엄덕문은 세종문화회관 부지가 좁으니 현실적으로 불가한 점을 강조했고, 최종 4200석 남짓으로 개관했다(리모델링을 거치며 현재는 약 3000석으로 운영 중이다).
5000석을 요구한 것은 남북이 통일됐을 때 대의원 회의를 세종문화회관에서 해야 하는데, 그때의 남북 대의원 수를 그렇게 추정한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당시는 국민적 관심이 경제 성장에 쏠려 있어서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예술공간 건립에 대한 여론은 그리 곱지만은 않은 때였다. 이런 대화 국면의 체제 경쟁이 없었다면 한국 최대의 공연시설인 세종문화회관이 탄생하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다. 김일성 생일(4월 15일) 전날인 4월 14일을 개관 날짜로 잡은 점, 당시 동양 최대의 파이프오르간을 대극장에 설치한 점 등에서 북한을 이기려는 정권의 의지가 읽힌다.
한옥 구조와 형태 어떻게 반영됐나
건축가 엄덕문은 어떻게 세종문화회관을 우리 식으로 현대화했을까. 세종문화회관은 전통적인 한옥의 ㄷ자 구조로 설계됐다. 안채(대극장), 행랑채(체임버홀), 사랑채(M씨어터)가 안뜰(데크프라자)을 감싸고 있는 구조다. 면적이 좁으면서 마름모꼴의 기형적인 형태인 대지 특성을 잘 활용한 것이다.
세종문화회관에는 그가 거부한 것처럼 한옥의 기와지붕과 서까래는 없다. 하지만 그런 전통적인 미감을 느낄 수 있도록 추녀와 서까래를 추상화했다. 뿐인가. 정면의 화강암 열주(列柱)는 서양의 석조 건축에서 보이는 도리아식, 이오니아식이 아니다. 전통 목조 건축에서 쓰이는 배흘림기둥의 형태에서 땄다. 기둥 꼭대기는 전통 목조 한옥에 쓰는 공포(처마 끝 하중을 받치기 위해 기둥머리에 댄 나무부재)를 형상화해 장식했다.
전통 건축의 여러 요소를 짜깁기해 콘크리트 기와를 얹은 국립민속박물관(강봉진 설계·71년 준공)과 비교해보면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겠다는 엄덕문 식의 건축 철학이 세종문화회관에 어떻게 구현됐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세종문화회관은 일제강점기에 서양식 석조 건축 양식 그대로 들어선 덕수궁 석조전, 미쓰코시백화점(현 신세계백화점)과 비교해도 맛이 다르다. 세종문화회관 앞에 서면 왠지 모르게 한국적인 냄새가 난다. 추녀와 서까래, 공포, 기둥 등 이어지는 선(線)의 맛이 있기 때문이다.
엄덕문은 한발 더 나아갔다. 정면에는 동종(銅鐘)에서 보이던 비천상(飛天像) 부조를 장식했고, 격자와 떡살무늬 창살을 커다랗게 달았다. 내부에도 솥뚜껑과 청사초롱을 형상화한 샹들리에를 설치했다(이 둘은 아쉽게도 리모델링을 거치면서 사라졌다). 다행히 다산을 상징하는 박쥐 문양 부조는 남아 있다. 구석구석의 디테일에서 “한국적 정서를 건물에 녹여내고 싶었던” 건축가의 마음이 읽힌다.
흥미롭게도 추녀 부분은 석조로 보이지만 실은 알루미늄 캐스팅으로 만들어졌다. 국내에는 없던 공법이었지만, 그때 일본에서 유행했다고 한다. 엄덕문은 한양대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유학했기 때문에 일본 건축계 동향에 밝았다.
세종문화회관 공모 당선 직후인 73년 엄덕문 건축사무소에 입사한 서상하(73) 플러스엄이건축 회장은 “당시 알루미늄 캐스팅 공장이 국내에 없어서 신진자동차의 엔진 주물 공장에 주문해서 해결했다”고 회고했다.
세종문화회관은 한국 건축사에서 70년대 전통의 현대화를 고민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평가받는다. 김종헌 배재대 교수는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등이 흉물 논란, 왜색 논란을 빚은 이후 당시 건축계는 전통의 현대화를 외면했다. 그런 속에서도 엄덕문은 형태적인 측면에서 전통의 현대화를 고민했다”고 했다. 안창모 교수 역시 “전통 건축을 현대적 어휘로 표현하려고 시도한 점을 높이 산다”고 했다.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과천 정부2청사 등이 엄덕문이 설계한 또 다른 작품이다.
손영옥 미술·문화재전문기자 yosohn@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