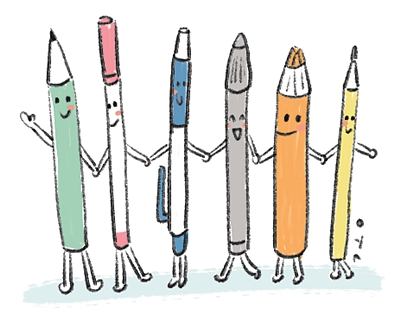
글쓰기 수업의 마지막 날, 작은 서점은 아쉬움으로 가득했다. 그날은 평소보다 수업을 일찍 마치고 치킨집으로 이동해 뒤풀이를 했다. 우리가 알게 된 건 고작 5주,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한두 시간이었는데 알고 지낸 지 좀 더 오래된 기분이 들었다. 집에 가서 글쓰기 숙제를 하는 시간에도 서로 연결돼 있었기 때문일까. 글이란 어쩔 수 없이 글쓴이를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대학 시절 나는 글쓰기 모임을 찾다가 인터넷 글쓰기 동호회에 가입했다. 생전 처음으로 참여한 글쓰기 모임이었다. 오프라인 모임에서 만난 동호회 리더는 이렇게 말했다. “글을 통해 사귄 벗을 문우, 혹은 글벗이라고 합니다.” 나는 ‘글벗’이란 말이 마음에 들었다. 글벗. 입안에서 그 단어를 몇 번 굴려보았다. 친근하지만 낯간지러운 단어라고 생각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글벗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글쓰기 모임은 때때로 해산되었으므로 나는 다시 다른 모임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몇 명의 글벗을 만날 수 있었다. 어떤 친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글벗이었고 어떤 친구는 글벗인 줄 몰랐는데 한참 후에 글벗이었음을 깨닫기도 했다. 누군가와는 오래전 연락이 끊겼지만 여전히 글로써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 그의 첫인상은 흐릿하지만 첫 글은 비교적 선명히 기억난다. 그만 잊어주었으면 싶은, 오래전에 쓴 글을 자꾸 입에 올리며 놀려먹는 친구, 글벗. 그러고 보면 글벗이란 참 재미난 인연이다. 아무도 봐주지 않는 내 글을 읽어준 사람만이 글벗은 아닐 것이다. 쓰고 싶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킨 누군가, 글의 씨앗에 물을 뿌려준 사람. 글벗은 글이라는 망망대해에서 허우적대고 있던 내게 누군가 던져준 구명보트였다.
이제는 서로에게 글벗이 된, 조금씩 멀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멀리서 쳐다봤다. ‘마지막 수업’은 마지막 수업이 아니었다. 그들의 글쓰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
김의경 소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