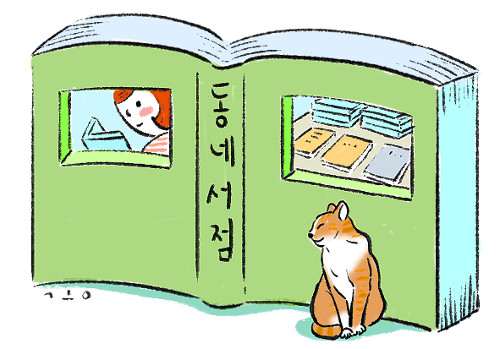
인터넷에서 ‘동네서점’을 검색하면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이름들이 흘러나온다. 꽃피는책, 사슴책방, 그건그렇고, 구름책방, 소리소문, 모모, 단비책방, 나이롱, 여행가게…. 이름만 들어서는 서점이라는 것을 알기 힘든 곳도 여럿이다. 서점 주인들은 서점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름을 짓는 과정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곳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달에는 평소 가보고 싶다고 생각만 하고 가보지 못했던 동네서점을 찾아다녔다. 나는 홀로 일곱 군데의 작은 서점을 탐방했다. 지하철을 타고 한 시간이 더 걸리는 서점을 찾아가는 것은 작은 여행이라고 할 수 있었다. 지하철역에서 내릴 때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렇게 만난 동네서점들은 대부분 열 평 이내의 좁은 공간이었지만 저마다 개성이 뚜렷했다. 모두 같은 서점이지만 공간을 메운 책도, 책방의 분위기도 달랐다. 하지만 손님이 적다는 점에서는 같았다. 내가 방문한 시간에는 주인과 나 단둘뿐이었다. 그래서 서점 주인의 추천으로 구입한 책은 더욱 특별한 인연으로 느껴졌다. 책을 읽는 인구가 줄어가고 동네서점도 줄어간다. 하지만 동네서점이 없는 거리를 상상하긴 힘들다.
서점 탐방 마지막 날에는 길을 헤매다가 어둑해진 저녁에야 서점에 도착했다. 1층에 입점한 서점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다. 서점 안에는 희미한 조명이 켜져 있었는데 빈티지한 분위기의 서점은 신비롭고 비현실적인 느낌이 났다. 서점 앞에는 길고양이 두 마리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누군가 놓고 간 사료를 먹고 있었다. 인간이 모두 잠든 시간, 혹시나 길고양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면 회의가 이뤄지는 장소는 아마도 동네서점이 아닐까. 동네서점이 없는 거리를 상상하는 것은 길고양이가 없는 거리를 상상하는 것과 비슷하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괜히 서운해지는 것이다.
김의경 소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