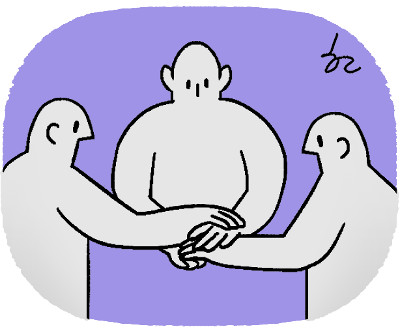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 맞붙은 1987년 13대 대통령선거는 민주진영에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선거로 회자된다. 민주화 바람이 거셌던 당시 사회 분위기상 김영삼·김대중 후보단일화만 성사되면 승리는 떼어놓은 당상이었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해서다. 민주진영은 1244만표(김영삼 633만표·김대중 611만표)를 얻고도 828만표를 얻은 노태우 후보에게 졌다. 양 김이 서로 자신으로의 단일화를 주장하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악수를 둔 셈이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단일화로 성공한 케이스. 노무현 이회창 정몽준 3자 대결구도로 시작된 16대 대선은 이회창 후보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강(이회창)과 2중(노무현·정몽준)의 격차가 너무 컸다. 뻔한 패배가 예상되자 노무현·정몽준 간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단일화 합의가 이뤄졌고, 여기서 승리한 노무현 후보가 본선에서도 이회창 후보를 꺾고 청와대 입성에 성공했다.
엿새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 몇몇 선거구에서 후보단일화 여부가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후보 간 3자 대결이 치열한 곳, 통합당은 민주당 통합당 무소속(통합당 탈당) 후보가 경합을 벌이는 곳이다. 16대 대선처럼 민주당·정의당 또는 통합당·무소속 후보단일화가 이뤄지면 금배지 주인이 바뀔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다.
그러나 여론조사상 후보단일화 없이는 패배가 확실한데도 단일화가 성사된 곳은 거의 없다. 87년이나 지금이나 자신으로의 단일화를 요구해서다. 후보단일화는 당이, 그리고 후보가 절박해야 성사된다. 16대 대선 때 새천년민주당이, 노무현 후보가 그랬다. 예상되는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단일화를 않겠다는 건 그만큼 절박하지 않다는 얘기다. 후보단일화 변수는 선거철 단골메뉴다. 할듯말듯 지루한 줄다리기를 하는 걸 보노라면 유권자가 우롱당하는 느낌도 든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인데 방울 달겠다는 정치인이 안 보인다.
이흥우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