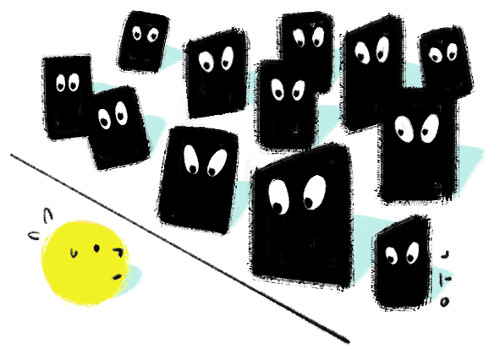
전쟁, 테러, 전염병이나 자연재해가 사회를 뒤집어 흔들면, 어둠 속에 깊이 숨어 있던 혐오가 스멀스멀 기어 나온다. 이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는 끝도 없이 많다. 대지진 후 민심이 흉흉해지자 과거의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말을 만들어 대학살을 자행했다. 독일에서는 유대인이 비난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고, 중세시대에는 힘없는 여자들이 마녀로 지목되어 불구덩이에 던져졌다. 거대한 불안이 덮칠 때 연약한 인간은 단순하고 간편한 적을 필요로 한다. 인종과 성별, 종교와 정치 성향 등 자신과 다르다고 선 그을 수 있는 모든 반대편을 적으로 몰고, 남은 우리는 한편이라며 안심하는 것이다. 철없는 아이들도 아닌 한 나라의 수장들이 핏대를 세우며 전염병을 다른 나라, 다른 인종의 병이라며 입씨름한다. 아시아인은, 유럽인은, 저 나라 사람들은 우리와 국적이, 언어가, 피부색이 다르니까. 우리와 같지 않으니까.
서로 쉼 없이 선을 긋고 증오하여 폭력이 시작될 때 엄청난 상처에 기인한 보복의 역사가 반복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의 핑퐁만이 문제가 아니다. 홀로코스트를 겪은 조부모의 손자 손녀 대에도 외상에 취약한 변이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듯, 폭력의 후유증은 대를 이어갈 뿐 아니라 당장 현재의 공포에 질린 아이들의 뇌 역시 불안에 곪게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덕분에 촘촘한 학원 스케줄 뺑뺑이에서 벗어나 따듯한 가정에서 어른들의 보호 아래 안락하게 지내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학교로, 야외로 잠시의 벗어남조차 막힌 채 가정폭력과 노인, 아동학대자의 손에서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약자들도 있을 것이다. 전 세계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신고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 거센 코로나의 파도가 지나간 훗날, 과연 그 자리에 무엇이 남을까. 부디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할 이들이 살아남길, 간절히 기도한다.
배승민 의사·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