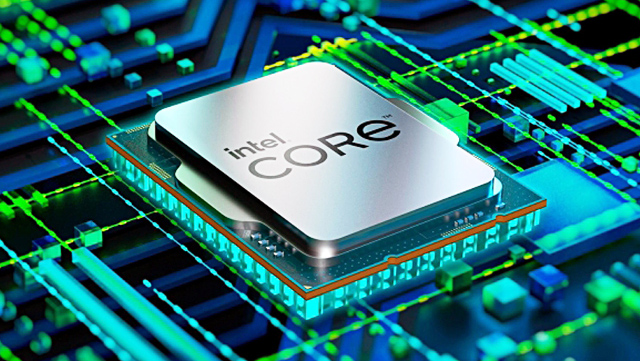
인플레이션 바람이 PC에까지 불어닥치고 있다. 전 세계 PC의 중앙처리장치(CPU)를 장악하고 있는 인텔이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PC업계는 수요 부진과 가격 인상이라는 이중고 앞에 놓였다.
PC 시장은 스마트폰 등장 이후 지속해서 감소세를 보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반등했다.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PC, 노트북 등의 교체 수요가 늘었다. 하지만 엔데믹 상황으로 전환하면서 PC 수요는 제자리로 돌아갔다.
25일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 세계 PC 출하량은 7200만대로 지난해 2분기보다 12.6% 감소했다. 수요가 줄어든 데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공급망에 문제가 생긴 게 결정타로 분석된다. 레노버(-12.5%), HP(-27.5%), 델(-5.2%), 에이서(-18.7%), 에이수스(-4.3%) 같은 주요 PC 제조업체는 큰 폭의 출하량 감소를 겪었다. 다만, M1 칩셋의 인기로 맥북 판매량이 늘어난 애플의 출하량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증가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전반적인 PC 시장 위축에 더해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증가로 업체들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렸다. 기타가와 미카코 가트너 연구이사는 “인플레이션으로 비용이 증가한 상황에서 PC업계는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수요 감소에도 평균 판매가격(ASP)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텔이 CPU를 비롯한 주요 제품의 가격 인상을 예고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PC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에 따르면 인텔은 CPU 등 주요 제품의 가격을 올리겠다고 고객사에 통보했다. 정확한 인상 폭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CPU 등은 최대 20%까지 값이 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텔은 올해 초 재료비, 운송비, 인건비 상승에 따라 칩셋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체 칩셋으로 전환을 끝낸 애플을 제외하면 주요 PC 업체는 대부분 인텔 CPU를 주력으로 사용한다. PC업체들도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비용 압박을 느끼고 있는 데다, 핵심 부품인 CPU 값이 오르면 완제품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단, 그래픽카드나 메모리 반도체 등의 가격은 반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가격 상승 요인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것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그래픽카드 가격은 가상화폐 채굴방식 변경 등으로 수요가 줄면서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도 주요 업체가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하반기에 가격이 하락한다는 예측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CPU가 20% 올랐다고 완제품 가격이 그만큼 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복합적인 가격 상승 요인을 안고 있다. 때문에 일정 수준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