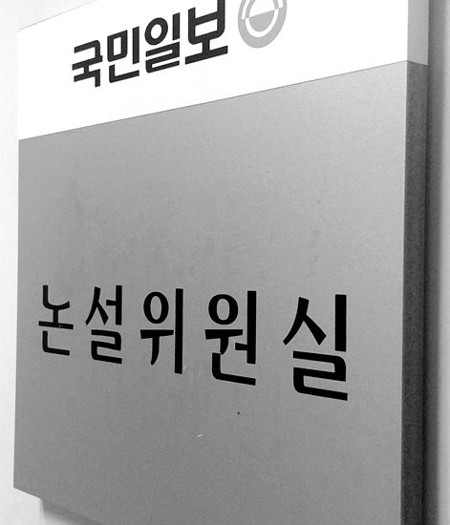
폭염이 연일 맹위를 떨치고 있다. 가장 더웠다는 1994년 기록을 넘어설 것이라니 좀처럼 겪어보지 못한 더위다. 이런 더위엔 그저 이글거리는 태양을 피해 허해진 기를 보충하는 게 최고의 피서법이다. 여름 보양식 하면 예부터 삼계탕과 보신탕이 대명사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애견 인구가 크게 늘면서 개 식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외국에선 캥거루와 악어, 달팽이도 먹는데 유독 보신탕만 문제 삼는 건 개가 인간과 가장 친숙하고 가까운 동물이기 때문일 거다. 애완의 수준을 넘어 반려의 지위에 오른 개를 먹다니 동물보호단체 입장에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잔학행위가 분명하다. 반면 개고기 옹호론자들은 우리나라에서만 먹는 것도 아니고 개도 축산법상 엄연히 가축인 이상 먹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한다.
보신탕 문화가 사회 이슈화된 건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서다. 당시 정부가 대외 이미지 하락을 우려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대로변 보신탕집이 된서리를 맞았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의 개고기 문화는 한국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주된 요소의 하나가 된 지 오래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도 외신들은 한국의 개고기 식용 문화를 집중 조명했었다. 외신들이 어떻게 보도했는지는 보지 않아도 안다. 지난 초복에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전 부인 프리실라 프레슬리와 킴 베이싱어 등 할리우드 유명 배우들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 앞에서 개고기 식용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처럼 개고기 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화될 때마다 “한국인이 먹는 것은 ‘구(狗)’이지 ‘견(犬)’이 아니다”고 항변했다는 한 외교관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반려견과 식용으로 사육되는 ‘황구’ ‘백구’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한국의 개고기 문화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고 한다. 눈물겨운 애국심이다.
현행법상 개는 가축이나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 범위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축산법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돼지, 사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하위 규범인 축산법 시행규칙에 노새, 당나귀, 토끼, 꿀벌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가축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가축의 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의한 가축에는 개가 없다. 이 법에서 정의한 가축은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그밖에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다. 식용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축은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다. 개는 꿀벌과 마찬가지로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가축이 아니라는 말이다. 소와 돼지 등의 경우 소비량 통계가 있는 반면 개고기 소비량 통계가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오랜 관습이란 이유로 식용이 묵인되다 보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사람들이 먹다 남긴 상한 먹이를 주고, 사육장 환경이 아무리 비위생적이어도 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 때문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적용을 받는 다른 식용 가축들과 달리 식품으로서 안전성 문제를 담보할 수 없다. 개고기가 다른 육류에 비해 영양 성분이 뛰어난 것도 아니다. 보신하려다 외려 몸 상하기 십상이다. 곧 말복이다. 이제 개를 복(伏)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줄 때가 됐다.
이흥우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