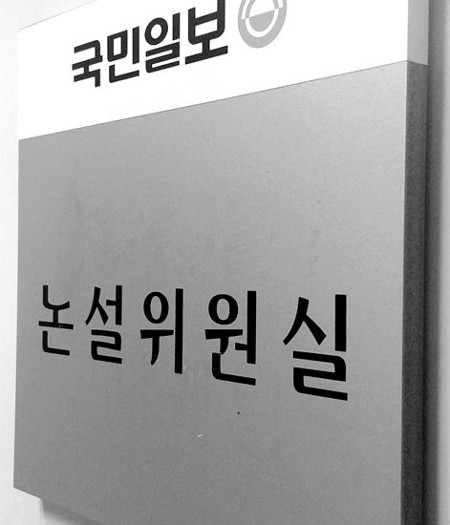
이것을 온정(溫情)이라 하자니 왠지 망설여진다. 충남 부여의 아파트 무인택배함 앞에 지난주 아이스박스가 놓였다. 꽁꽁 얼린 얼음물과 요구르트, 비타민 음료가 들어 있었다. 메모와 함께였다. ‘택배기사님께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더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폭염에 고생하는 배달원을 위해 어느 주민이 놓아둔 것이다. 땀에 젖은 누군가가 목을 축이며 맛본 것은 이웃의 정(情)일 테다. 이런 마음씨를 흔히 온정이라 불러온 건 한국의 겨울이 다른 계절보다 혹독하기 때문이었다. 추위가 닥쳐오면 힘겨운 이들이 많아졌고 그들에게 베푸는 정은 사회에 온기(溫氣)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정을 말할 때 따뜻할 온(溫)을 붙였던 것인데 부여 아파트 주민이 베푼 건 냉기(冷氣)였다. 언어습관을 따르려니 얼음물에 담긴 정을 온정이라 말해야 하는 어색한 상황이 됐다. 한국의 여름은 이제 겨울처럼 정을 나눠야 하는 계절이 돼 버렸다. 곳곳에서 ‘시원한 온정’ 이야기가 들려온다.
서울 방배동 아파트에선 한 주민이 엘리베이터에 글을 써 붙였다. ‘대책 없는 무더위에 경비 아저씨들은 어떻게 견디시나 마음 한편이 무겁습니다. 경비실에 냉방기가 설치되면 각 가정에서 경비실 전기요금을 나눠 낼 의향이 있으신지요?’ 엘리베이터는 투표장이 됐다. 찬성한다는 포스트잇이 잇따라 붙었고 제안한 이는 자비로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했다. 서울 금호동에 사는 주부들은 2∼3일에 한 번씩 인근 임대아파트 노인들을 찾아가 반찬과 얼음물을 건네고 청소를 돕는다. 대구 자원봉사자 120여명은 달성공원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니며 차가운 물을 나눠주고 있다. 폭염에 생산량이 너무 늘어 폐기될 뻔했던 강원도 화천 애호박은 농가 시름을 덜어주려는 온라인 주문이 폭주해 완판됐다.
북극권 에스키모인은 남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법이 없다고 한다.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저 사람도 고민이 많을 텐데 내 고민까지 얘기해 부담을 줘선 안 된다고 여긴다. 칼바람 부는 겨울을 집에 앉아 묵묵히 견디다 고민의 무게가 한계를 넘어서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들의 방식은 틀렸다. 올여름 광주는 1980년 그날을 연상케 했다. 시민들로 구성된 각 지역 자율방재단이 움직였다. 서구 방재단은 풍금사거리에서 생수 25상자를 시민들에게 나눠줬고 남구 방재단은 아이스 스카프를 만들어 노인들에게 전달했으며 북구 방재단은 경로당에 미숫가루를 실어 날랐다. 광주은행은 74개 영업점을 모두 무더위쉼터로 개방했다. 광산구 건설업체는 공사장에서 반경 2㎞까지 살수차로 물을 뿌렸다. 동네 근린공원에 매일 생수 400병을 갖다놓는 주민도 있다. 서로의 고민을 함께 걱정하고 저 사람이 고민스러울 테니 찾아가 들여다보는 게 정을 나누는 우리의 방식이다.
프랑스 고인류학자 파스칼 피크는 인류에 ‘호모 클리마투스(Homo Climatus)’란 새 이름을 붙였다. 기후에 적응하는 인간을 뜻한다. 과거 수차례 빙하기를 견디며 살아남았는데 이제 스스로 초래한 기후변화에 적응해야 할 처지가 됐다. 인류가 가장 잘하는 게 적응이란 사실은 이번 여름에도 입증됐다. 연일 40도에 육박하던 수은주가 35도로 떨어지자 사람들 입에서 “이 정도면 괜찮네”란 말이 나왔다. 기후변화를 막는 친환경 생활방식에 적응하는 것이 더 현명하겠지만 하루아침에 될 리는 없다. 폭염에 적응해야 한다면 시원한 온정이 좀 더 수월하게 해주지 않을까.
태원준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