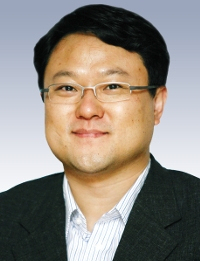
영화 ‘82년생 김지영’의 관객 수가 개봉 18일째인 지난 9일 300만명을 넘어섰다. 소설을 읽고 공감했거나 먼저 관람한 이들의 입소문을 듣고 극장을 찾은 이들이 많았다. 영화가 개봉도 되기 전부터 ‘별점 테러’가 벌어지는 등 논란이 되자 호기심에 보러 간 이들도 꽤 있었던 것 같다. 누구도 의도하지 않은 ‘노이즈 마케팅’ 효과가 발생한 셈이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반발해 극우 성향 일베 회원들이 벌인 유니클로 구매 인증하기가 역효과를 낸 것과 비슷하다. 유니클로를 일베나 입는 옷으로 만들어버려 불매운동에 오히려 기름을 부었다.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조국’에 이어 ‘김지영’도 가까운 사이일수록 언쟁을 피해야 하는 금기어에 올랐다. 소설은 작가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이 찾아 읽었지만, 영화의 문턱은 소설보다 훨씬 낮았다. 부부나 연인, 친구 사이에 이 영화를 놓고 티격태격하다 아예 갈라서거나 의절할 뻔했다는 하소연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정확한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는 페미니즘을 포털에서 검색해봤다는 이도 있었다.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진영논리, 흑백논리의 위세가 여기서도 확인된다. 조금이라도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이쪽이냐 저쪽이냐, 촛불이냐 태극기냐, 페미냐 안티냐 추궁한다. 조국 전 장관은 이런 면에서 훌륭한데, 저런 면에선 아닌 것 같다고 하면 쓸개 없는 인간 취급 받기 십상이다. ‘82년생 김지영’도 비슷하다. 이런 부분은 공감이 가는데 저런 부분은 과장 같다고 하면 찬반 양쪽에서 다 공격받는다.
2019년 한국 사회는 진보와 보수, 노동과 자본, 페미니즘과 안티페미니즘 같은 거대담론에 매몰돼 있다. 가치와 이념 중심의 거대담론은 방향 모색에 참고가 될지 몰라도 눈앞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는 못한다. 페미니즘과 안티페미니즘의 시각으로 본다면 ‘82년생 김지영’에 담긴 많은 이야기가 사장된다. 그 이야기들이 과장인지 아닌지, 극단적인지 아닌지 논란은 사실 핵심이 아니다. 픽션인 김지영 이야기가 동시대인의 공감을 얻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한국교회와 크리스천들은 ‘82년생 김지영’을 페미니즘이나 가부장제 같은 거대담론이 아니라 주변 이웃들이 삶 속에서 겪는 이야기라는 시각에서 보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근본적 해결까지는 아니라도 홀로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나누고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찾을 수 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15)는 말씀처럼 이 시대 고통받는,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슬픔과 고통을 나누는 게 교회의 소임이다.
김지영이 많은 공감을 얻은 문제 중 하나가 ‘독박’ 육아였다. 김지영은 딸이 어린이집에 다니기 전까지는 종일 육아에 매달렸다. 어린이집에 맡긴 다음에도 퇴원시간에 맞추기 힘들어 구직을 포기했다.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100조원 이상을 투입하고도 육아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 못했다는 건 어이없는 일이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치부하는 대신 지역에서 육아 공동체나 육아 카페를 운영하는 교회들이 있다. 영유아들이 쉬거나 놀 수 있는 공간을 갖춘 카페에 엄마들이 모여 휴식을 취하고 육아 정보도 나누게 한다.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을 돌봐주고 전문가가 육아 및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 서로 품앗이로 아이를 봐주기도 한다. 같은 상황의 엄마들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얻는다는 엄마들이 많다.
임산부에 대한 존중과 배려 문화를 확산하는 것도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김지영이 분노한 ‘맘충’이라는 표현은 모성에 대한 테러다. 최근 신조어 중에 가장 반생명적이고 반인격적인 표현이다. 생명을 귀히 여기는 교회부터 임산부를 존중하고 우대하는 모습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면 좋겠다. 육아든 집안일이든 부부 공동의 책임이며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해 여성의 사회활동이 제약받아서는 안 된다는 인식도 더 확대돼야 한다. 개화기 때부터 여성 교육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헌신해온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잘할 수 있는 일이다.
구체적인 문제에는 구체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이념이 달라도 구체적인 해법에선 의견일치를 볼 수 있다. 작은 해법들이 모여 거대한 사회적·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교회는 이런저런 이념에 휘둘리지 않고 고단한 이웃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좋겠다.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
송세영 종교부장 sysohng@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