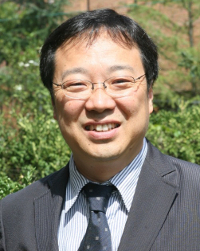
10월의 마지막 즈음에 무수한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 일이 벌어진 지도 벌써 2주가 되면서 참사 자체에 대한 기억과 함께 참사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먼저 동양사상에 의하면, 우리 곁을 떠난 이들은 이제 사자(死者) 단계를 넘어 망자(亡者) 단계에 들어섰다. 즉 그들은 이미 역사가 돼가고 있다. 또한 참사에 대한 명칭 변경이 제기됐다. 국가애도기간 종료 시점에 특정 지역에 대한 낙인 효과를 막기 위해 ‘이태원 참사’가 아닌 중성적 의미의 ‘10·29 참사’로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 세월호 참사와 이번 참사의 유사성에 착안한 발언들이 이어졌다. 그래서 필자도 칼럼 제목을 ‘4·16과 10·29, 조가(弔歌)와 애가(哀歌)를 부르자’로 잡았다.
생때같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 일을 이렇게 부르면 어떻고, 저렇게 부르면 어떻단 말인가. 필요하면 명칭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가 달라지는지. 지금 정작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어느 목숨 하나 귀하지 않은 게 없지만 젊은이의 목숨은 더욱 그렇다. 너무나 일찍 목숨을 잃어서 그렇고, 너무나 하찮게 생을 마감해서 그렇고, 너무나 어이없이 목숨을 빼앗겨서 그렇다. 4·16과 10·29는 그저 닮은 것만이 아니다. 4·16 세대가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다시 10·29 세대가 됐다. 10대에 4·16을 맞았던 청소년들이 자라서 20대에 10·29를 맞은 청년들이 됐다. 이들을 누가 어떻게 위로할꼬. 이들을 누가 ‘트라우마 세대’로 만들었는가. 이들은 앞으로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4·16을, 10·29를 맞아야 할까. 왜 100세 시대에 들어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요절의 일상화를 강요당해야 할까.
우리에게 4·16과 10·29만 있는 게 아니다. 지금도 수많은 숫자가 죽음의 상징이 되고 있다. 불과 지난달과 이달만 돌아봐도 목록은 늘어만 간다. 10월 15일에 20대 근로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여 숨져 10·15가 됐다. 11월 7일에 20대 근로자가 1.8t 철판 롤에 깔려 사망해 11·7이 됐다. 20대만 그런가? 10월 20일에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반복됐던 건설회사 소속 50대 근로자가 크레인을 조립하다가 추락해 끝내 숨져 10·20이 됐다. 10월 23일에 같은 그룹의 40대 근로자가 손가락이 절단돼 10·23이 됐다. 11월 5일에 이미 사망 사고가 누적된 철도 분야에서 30대 근로자가 화물열차를 연결하고 분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숨져 11·5가 됐다.
동료가 숨지는 것을 옆에서 목격한 근로자들은 어떤 돌봄을 받았을까. 당장 일을 중단하고 심리치료부터 받았을까. 끔찍한 사고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을 안전장치가 마련됐을까. 소속 단체의 일원으로 확실히 보호해준다는 확신을 얻었을까. 무엇보다 목숨이 중요하다는 근본적 도리가 현실이 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까.
요즘 사회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어디에다 기대를 걸고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막막하다. 정치권은 10·29를 또 하나의 정치적 이슈로만 대하는 것 같다. 경제계는 경제 발전을 위해 근로자 희생이 당연하다는 수십 년 전의 논리에 안주하는 것 같다. 사회는 사고 발생을 심상하게만 여기는 모습이다.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 취급을 받는 사회는 선진국이 아니다. 아니 제대로 된 나라도 아니다. 지금 한국인은 그런 대접을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받을 이유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된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참사 공화국’의 오명부터 벗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15) 지금은 죽은 자를 위한 조가를 부를 때요, 남은 자를 위한 애가를 부를 때다. 함께 우는 것도 성경의 명령이다.
안교성 장로회신학대학교 역사신학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