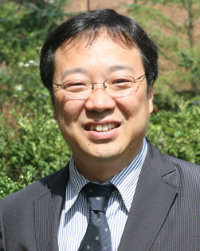
“아이도 없고, 여친도 없어요, 저부터 구해주세요.” 어느 날 길에서 달리던 오토바이 배달원의 배달 상자 뒷면에서 읽은 글귀다. 고독, 삶의 고단함, 삶의 소중함이 피부로 느껴졌다. 물론 그 글귀의 후반부 내용은 ‘아이부터 구해주세요’의 패러디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아이 없어요, 저부터 구해주세요”라는 자동차 뒷유리 글귀는 장난기가 느껴졌다면 “아이도 없고, 여친도 없어요, 저부터 구해주세요”라는 글귀는 사뭇 다른 느낌을 줬다. 계시와도 같은 경험인지, 그 이후로는 길가를 누비는 오토바이 배달원을 볼 때면 단순한 근로자가 아닌 한 명의 청년으로 보인다.
오늘의 청년세대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힘겨운 삶을 이끌고 있다. 일찍이 일제강점기인 1929년에 언론인 민태원은 ‘청춘예찬’에서 청춘의 이상과 약동을 노래했다. 당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요 후진국이었지만 글에서 힘찬 기운이 느껴진다. 그런데 21세기 초에 교수 김난도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에서 인생의 아픔 가운데 빠진 청년에게 감내할 용기의 메시지를 전해줬다. 당시 한국은 반세기 만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하는 등 비약적 발전을 이뤘지만, 책은 ‘청춘예찬’보다 맥 빠진 느낌이 든다. 왜 이런 역설이 벌어졌나?
오늘날 한국 사회는 청년세대를 다소 오해 소지가 있는 틀을 통해 접근하는 경향을 보인다. 첫째, 가장 보편적인 것이 ‘세대’적 관점이다. 단적으로 말해 나와 다르다는 것이다. 이 관점은 한편으로는 세대차를 민감하게 인지하고 그런 차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차이를 과장하거나 심지어 전제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역사상 언제나 세대차는 있었고, 각 시대는 그것을 인식했다. 문제는 평가 기준이다. 가부장적 전통사회에서는 젊은이가 문젯거리였다면, 젊음이 이상형이 된 현대사회에서는 노인 차별을 비롯한 연령 차별이 만연한다. 쌍방적이고 평등한 평가와 공감이 중요하다. 선진국에서 태어난 청년세대에게 ‘헝그리 정신’을 외치는 것은 공허하다. 상황에 맞지 않는 생뚱맞은 말이다.
둘째, ‘신(新)인간’적 관점이다. 요즘 청년세대가 전혀 ‘새로운 존재(nova creatura)’라서 공감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청년세대를 별종으로 본다. 그러나 사회는 전세대, 현세대, 후세대(다음세대)가 연계되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게끔 돼 있다. 최근 노인이 청년세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우선적인 일이 바로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다고 한다. 청년세대가 신세대라서 새로운 것을 잘 아니까 도울 수 있는 것이다. 요즘은 멘토링도 세분돼 전세대가 후세대를 멘토하는 전통멘토링, 동료끼리 멘토하는 동료멘토링, 후세대가 전세대를 멘토하는 역멘토링 등이 있다. 바야흐로 역멘토링 시대이니 이것에 익숙해야 한다. 새로움이 희망이다.
셋째, ‘퇴폐’적 관점이다. 간단히 말해 돼먹지 못했다는 것이다. 요즘 청년세대는 부도덕하다는 편견인데, 인간은 모든 세대가 부도덕하지 특정 세대가 더 부도덕한 것은 아니다. 기독교 인간론에 의하면 ‘인간은 모두 죄인’인데, 어느 세대든 ‘오십보백보’다. 각 세대는 나름의 죄와 부도덕이 있다. 꼰대세대는 꼰대세대대로, 신세대는 신세대대로. 가령 새치기는 필자가 어려서부터 익숙한 문화인데, 심지어 새치기를 처세술로 강요한 어른도 있을 정도로 새치기가 사회 각 분야에 확산되고 만연돼왔다. 그런데 요즘 맛집 등 ‘핫플(hot place)’이나 ‘힙(hip)한 장소’에 가면 젊은이들이 줄서기를 당연시하면서 길게 줄 서 있다. 시민교육이 축적된 결과다. ‘윤리적 소비’ 같은 개념도 청년세대에게서 힘을 발한다. 청년은 우리 미래다. 청년세대에게 잔소리 대신 이 말을 건네고 싶다. 미안하다 청춘아.
안교성 장로회신학대학교 역사신학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