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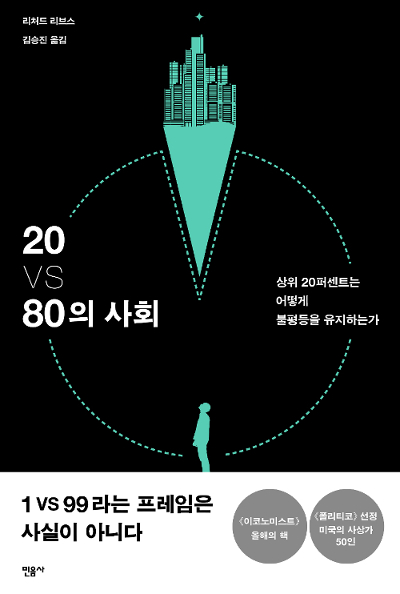
빈부격차의 실태를 선명하게 드러낸 영화 ‘기생충’의 결말은 그로테스크하다. 창졸간에 살인범으로 전락한 가난한 집안의 가장 기택. 그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로 전락해 살인을 저지른 장소인 부잣집으로 돌아가 지하실에 숨는다. 아들 기우는 어느 순간 아버지의 소재를 알게 된다. 하지만 그를 구할 방법은 없다. 영화에서는 기우가 고래 등 같은 이 부잣집을 매입하려고 둘러보는 상상의 시퀀스가 등장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기우는 과연 이 집을 언젠가는 살 수 있을까. 기생충을 만든 감독도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 듯하다. 봉준호 감독은 한 영화잡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문을 구해봤더니 (기우가) 최저임금을 한푼도 안 쓰고 모아서 박 사장 저택 같은 집을 사려면 547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왔다.”
물론 기우가 현실 속 인물이라면 평생을 최저임금 노동자로 살진 않을 것이다. 감독의 저 말은 계급 역전의 기회가 그만큼 희미하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리라. 그리고 계급 사이에 이렇게 바리케이드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은 세계적인 현상이 돼가고 있다.
‘20 VS 80의 사회’는 불평등 문제를 파고든 신간이다. 미국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일하는 경제학자 리처드 리브스(50)가 썼다. 저자는 영국에서 태어나 40대 초반까지 고국에서 활동하다가 2016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조국을 버린 건 영국의 계급 장벽이 마뜩잖아서였다(영국 상원에는 아직도 세습 귀족 의원들이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더 나았을까. 그는 “새 조국의 계급 구조가 내가 떠나온 옛 조국보다 더 견고하다는 것을 깨닫고서 매우 낙심했다”고 적어두었다.
어쩌면 이런 낙심이 책을 쓴 동기가 됐을 것이다. 그런데 많은 독자는 이 같은 생각부터 할 듯하다. ‘지구촌 불평등 문제를 다룬 책은 이미 서점에 차고 넘치지 않던가.’ 저자 역시 이런 우려를 모를 린 없다. 그는 “계급과 불평등에 대한 책을 또 한 권 내놓는 것은 쓸데없어 보일 수 있다”고 적었다. 그런데도 이 책을 소개하기로 한 것은 이색적인 지점이 있어서다.
우선 저자는 불평등의 구도를 상위 1% 슈퍼리치와 나머지 99%로 나누지 않는다. 그가 겨냥하는 계층은 상위 20%다. 수저론에 빗대자면 금수저뿐만 아니라 은수저나 동수저를 거머쥔 이들에게도 총구의 영점(零點)을 맞추고 있는 셈이다. 그는 이 계층을 “중상류층(upper middle class)”이라고 명명하면서 이들이 암암리에 어떤 특권을 누리고 이권을 취하는지 들려준다. 책을 읽으면 온갖 데이터를 통해 중상류층과 나머지 계층의 불평등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들이다. 중상류층 자녀는 대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하거나 대학에 입학할 때 많은 이점을 누린다. 각종 장학금을 받기도 한다. 부모의 인맥과 연줄 덕분이다. 중상류층은 온갖 기회를 사재기하며 자녀를 위한 “유리 바닥”을 만들고, 아래 계급 자녀들이 디딜 사다리는 걷어차 버린다. 저자는 이 같은 방식으로 부모 세대의 학력과 좋은 일자리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중상류층 아이들은 보통의 아이들과 매우 다르게 자란다. …미국에서 중상류층의 지위는 이전 어느 때보다도, 다른 어느 나라에서보다도 효과적으로 세습되고 있다.”
미국의 사정을 속속들이 파고든 신간이지만 ‘미국’이라는 자리에 ‘한국’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도 무리 없이 읽힌다. 아마도 어떤 이들은 책을 읽으면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저간의 논란을 떠올릴 것이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저자의 태도다. 그는 자신 역시 중상류층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그러면서 중상류층을 비판할 때는 “그들”이 아닌,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다른 이들의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 약간의 희생을 감수할 의사가 있느냐, 아니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다리를 걷어차고 싶어 하느냐는 것이다.”
이런 책이 흔히 그렇듯 마지막에 따라붙는 건 저자가 제시하는 처방전인데, 여기서도 저자는 하나 마나 한 이야기로 눙치고 넘어가지 않는다. 훌륭한 교사가 가난한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임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거나 80%를 위한 가정 방문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제안이 대표적이다.
‘20 VS 80의 사회’는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자기가 삼루타를 친 줄 아는” 중상류층의 각성을 촉구하는 작품이다. 중상류층이 기득권을 내놓는 건 무망한 일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우뚱한 세상을 바꾸려면 그 방법밖엔 없을 것이다. 저명한 보수주의 학자 유발 르빈이 한 말처럼 “우리의 목적은 불평등 자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계층의 경직성과 싸우는 것”이 돼야 할 테니까 말이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