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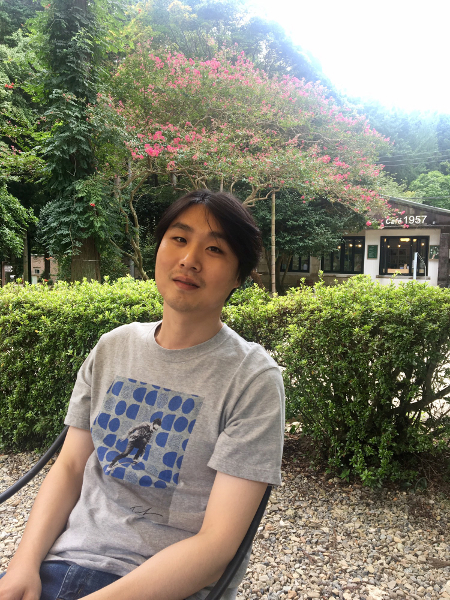


나는 중·고등학교 6년을 같은 학교에 다녔다. 지방 소도시의 천주교 재단 학교였는데, 나는 거기서 철학을 배웠다. 정확히 말하면, 철학을 배웠다기보다 ‘철학’이라는 수업 시간에 거기 앉아 있었다. 철학은 학교로 파견 나온 신부님이 가르쳤다. 철학 교과서도 있었다. 교과서는 소크라테스며 아리스토텔레스며 플라톤같이 이름만으로도 이미 멀리 떨어져 계신 선생들의 이야기들로 장식돼 있어 책장을 넘겨 들여다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철학 시간에 사색을 했다. 점심 메뉴는 뭘까. 어느 경로로 뛰어야 식당까지 빠르게 갈 수 있을까. 밥을 얼른 먹고 축구를 할까 농구를 할까. 오늘 한문 숙제를 안 했는데 축구나 농구를 포기해야 옳은 게 아닐까. 다행이었던 건, 철학 시간이니까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신부님이 사색을 용인해주었다는 것.
그때 거기에서였던 것 같다. 나는 누구인가, 처음 생각해봤던 기억. 신부님의 질문이었다. “너희 스스로 ‘나’가 누구인지 설명할 수 있겠니?” 사색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그다지 기억나지 않지만, 그 질문만은 기억한다. 이것은 그때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분명 생각을 했단 증거이기도 하다. 그때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도 기억한다. ‘내가 누구긴 누구야. 내가 나지. 임경섭, 17세, 지구인, 한국인, 원주 사람, 고등학생, 남자, 엄마 아빠의 아들, 누나의 동생, 금렬이 친구, 교회 오빠, 축구와 농구를 좋아하는….’ 가만있자. 근데 지금 내가 그냥 나라고?
당시 나는 ‘진짜 나’에 대한 더 이상의 진지한 고민 없이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렸다. 나는 그냥 나라고. 나에 대해 ‘나’ 이상의 어떤 설명도 불필요한 그냥 나라고. 하지만 그 ‘그냥 나’에 대해 생각하는 아주 짧은 순간 안에서도 이미 나는 단순한 ‘나’가 아니었다.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자 누군가의 동생이었고, 누군가의 제자이자 누군가의 친구였다. 누군가에겐 이웃이었고 누군가에겐 행인이었으며 또 누군가에겐 원수였을지도 모르지. 인식한 ‘나’만 해도 이 정도인데 인식 못 한 ‘나’는 대체 얼마나 많을까. 나는 ‘단순한 나’가 아니었다. 그 모든 것들이 얽히고설켜 한 뭉텅이가 된, 나는 ‘복잡한 나’였다.
우리는 대체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관심이 없다. 내가 누구인지 고민하는 것은 머리 아픈 철학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며, 더욱이 숨 돌릴 틈 없이 바쁜 현대인에게 그것은 사치의 문제로 치부되어버리기 때문일지 모른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바쁘다는 핑계로 나는 나에게 소홀했다. 그러다 한 권의 소설을 읽으면서 ‘나’가 다시금 궁금해졌다. 나는 잃어버린 나에게, 혹은 아직 만나지 못한 나에게 안부를 묻고 싶어졌다.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전혀 장엄하거나 정중하지 않게 근접하고 있는 소설. 어쩌면 엄숙한 존재 성찰의 방식에 구속되지 않은 채 이야기하고 있기에, 기존의 방식으로는 상상이 불가했던 새로운 둔기로 읽는 사람의 뒤통수를 연타하는 소설. 오한기의 신작 장편소설 ‘가정법’이 그것이다.
모든 문학이 그렇듯 ‘가정법’을 통해 오한기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 그것 가까이까지 우리를 이끈다. 그것도 아주 흥미롭고 통렬한 방식으로. 주인공은 ‘진짜 나’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변신한다. 주인공이 변신한 사물이나 현상, 관념들이 모두 주인공으로 인지될 때 그는 비로소 ‘진짜 나’를 찾게 될 터였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타인들에게 주인공은 그저 미치광이에 불과하다. 하지만 주인공은 변신을 멈추지 않는다. 그는 거울도 됐다가 도마뱀도 됐다가 형광등 빛도 됐다가 소나기도 됐다가 나무도 됐다가 병든 소가 된다. 병든 소? 이게 웬 뚱딴지같은 소리람? 하고 외면하는 당신, 당신은 특히 한번 읽어보시라. 주인공 ‘나’가 부조리한 세계를 목도하며 치열하게 ‘병든 소’가 되어가는 걸 보면 그 마음이 바뀔 테니까. 우리 현실에는 ‘병든 소’보다 훨씬 더 지독한 괴물로 변한 인간들도 살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말이다.
<임경섭·출판 편집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