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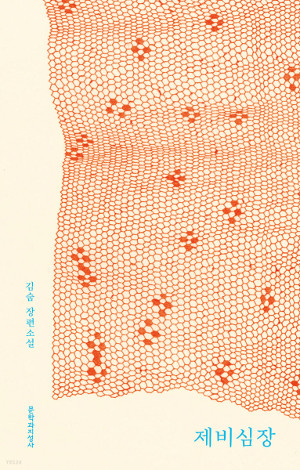
대우조선해양의 파업은 조선소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의 가혹한 현실을 세상에 알렸다. 0.3평 철제 구조물 속에 자신을 가두고 출구를 용접한 유최안씨의 모습은 그가 써서 내건 “이렇게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는 문장과 함께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김숨(48)은 조선소 노동자들을 소설로 써왔다. 지난해 9월 출간한 장편소설 ‘제비심장’에서 배로 조립되는 가로·세로·깊이 20여m의 철상자 속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의 모습을 그려냈다.
“세상 사람들은 알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철배를 만드느라 조선소에서 우리가 다치고… 또…”
“죽기도 한다는 걸…”
김숨은 2008년 ‘철’(鐵)에 이어 13년 만에 다시 조선소 소설을 발표했다. ‘철’이 1960∼80년대 조선소 마을 이야기라면 ‘제비심장’은 조선소 노동의 주력이 된 하청 노동자들을 다룬다.
“조선소에서 철배를 만드는 우리는 세 부류로 나뉜다. 정규직 노동자, 하청 업체에서 파견한 노동자, 하청 업체에서 재하청을 받는 물량팀에서 파견한 노동자. 나는 물량팀 노동자다.… 우리는 조선소에서 일하지만 조선소에서 임금을 받지 않는다.”
지난달 31일 서울 흑석동 한 북카페에서 만난 김숨은 대우조선 파업에 대해 “인간이잖아요. 연장이 아니잖아요. 감정이 있고 심장이 뛰고 있고 고통을 느끼는. 그런데 사람 취급을 안 해주니까 싸우는 것 아닌가요”라며 “그들이 무사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김숨은 소설을 쓰느라 여러 차례 울산을 오갔다고 한다. “그때도 천막에서 농성하는 노동자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거기서 본 한 노동자의 얼굴이 잊히지 않는다고 했다. “울산에서 폭염의 한 가운데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노동자들을 봤어요. 제가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횡단보도 건너편에 한 외국인 노동자가 서 있었어요. 어딘가 숙소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얼굴 표정에서 영혼이 다 빠져나간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 얼굴이 잊히지 않아요.”
인터뷰를 하기 위해 만난 60대 여성 노동자 얘기도 들려줬다. “(배에 페인트칠을 하는) 도장일을 하셨어요. 여성들, 나이 많은 여성들이 도장일을 많이 하세요. 그분의 남편도, 그분의 아들도 조선소에서 하청 노동자로 일했어요. 아들이 발판공인데, 발판공이 아주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런 아들을 보며 부모로서 자책감을 갖는 모습이 가슴 아팠어요.”
조선소 노동자들을 만나고 글과 사진으로 기록된 조선소 이야기들을 찾아봤다는 김숨은 “그분들이 저 강도 높은 노동을 어떻게 매일 매일 감당하는지, 그게 제일 놀라웠어요”라고 말했다.
“조선소라는 작업공간 자체가 극한의 인내심을 요구하는 환경이잖아요. 크고 어둡고 소음도 굉장하고 자칫하면 사고가 날 수 있고. 그 속에서 노동을 하다가 사람이 소비되고 마모되잖아요. 그러다 결국 노동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그 순간까지 노동을 해야만 일상생활이 유지되는 삶. 저로서는 그분들을 뵙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어요.”
시를 습작하던 김숨은 20대 중반이던 1997년 대전일보 신춘문예, 98년 문학동네 신인상에 잇따라 당선되며 소설가로 등단했다. 소설을 어떻게 쓰는지도 몰랐다는 그는 2005년에야 첫 소설집 ‘투견’을 냈고 그 후 장편소설과 소설집을 합해 22권을 쏟아냈다. 현대문학상, 대산문학상, 이상문학상, 동리문학상, 김현문학패, 요산문학상, 동인문학상 등 굵직한 문학상들을 거의 다 받았다.
조선소 소설은 위안부 소설과 함께 김숨을 대표하는 주제다. “거대한 배를 수천 명의 노동자가 만드는 거잖아요. (이야기보다) 이미지가 먼저인데, 그 거대한 배에 개미 떼처럼 노동자들이 매달려 노동하는 이미지가 제게는 소설적으로 다가왔어요.”
김숨은 어린 시절 울산 현대조선소 앞에 산 적이 있다. 아버지가 조선소에서 일했다. 어린 김숨은 조선소 앞에서 퇴근하는 아버지를 기다리곤 했다. 김숨은 “너무 어렸을 때라 당시 기억은 거의 없지만 조선소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은 늘 있었어요”라고 말했다.
‘철’을 쓰고 난 후 다시 ‘제비심장’을 쓰게 된 계기는 한 기사 때문이었다. “어느 날 기사를 봤어요. 비정규직 물량팀 노동자들이 어떻게 고용되는지에 대한 기사였는데, 구내식당 같은 데서 사지 멀쩡한지 보고 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고 끝이에요. 그게 면접이에요. 통과되면 업체에 널려 있는 헌 작업복 중 맞는 거 골라 입고 일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 기사를 읽고 난 후 조선소에 하청의 하청 노동자들이 어떤 과정으로 취업하고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거기를 떠나게 되는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제비심장’은 뛰어난 노동소설이다. 그러나 리얼리즘 계열의 전형적 노동소설과는 다르다. 그는 거대한 서사를 만들거나 구조를 고발하는 대신 짓눌린 개인의 고통과 슬픔을 섬세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데 집중한다. ‘제비심장’은 철상자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하루를 보여줄 뿐이다. 소설에는 맥락이 없고 발화자도 모호한 시적인 문장들, 연극적인 대사들, 동화적인 에피소드들이 계속 끼어든다.
이런 스타일은 김숨의 위안부 주제 소설들에도 구사된다. 김복동 할머니의 증언을 소설화한 ‘숭고함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를 보면, 일본군의 성폭행 장면 같은 건 나오지 않는다. 대신 소설은 할머니께서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일까, 가장 그리운 것은, 사랑은 해보셨을까,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같은 얘기들을 다룬다.
김숨은 강렬한 사회적 주제를 매우 개인적으로 우화적으로 다룬다. 그는 “피해자에 대한 소설을 주로 쓰게 됐는데, 피해를 적나라하게 쓰지 못하겠어요”라고 말했다.
“물론 (현실에서) 끔찍한 이야기들이 있죠. 하지만 자극적으로 쓰지 않으려고 해요. 과장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쓰는 게 잘 보여주는 것인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인가 하는 의문도 있어요. 저는 어떤 분들이 저한테 들어와서 제 소설의 인물로 탄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설을 쓰기 위해 그분들 삶을 가져와서 소비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시적으로 연극적으로 쓰고 싶었던 것 같고 그게 어떤 스타일이 된 것 같아요.”
김숨은 어떤 주제를 소설로 써내고 나면 거기서 빠져 나와 다른 주제로 가는 작가가 아니다. 몇 번이고 다시 그 주제로 돌아오는 편이다. 조선소 소설이 그렇고, 위안부 소설이 그렇다. 올해 출간 예정인 새 장편소설 역시 위안부가 주제다. 그는 “미 군정기 부산 풍경을 그린 소설”이라며 “전쟁 끝나고 귀환 동포들이 부산으로 들어오잖아요. 위안부들도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중 고향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부산에 남은 분들도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예요”라고 설명했다.
김숨은 소설을 쓴 지 25년이 됐지만, 여전히 소설 쓰는 게 즐겁다고 했다. 지금 쓰는 소설, 쓰고 싶은 소설이 많아서 소설 외의 글은 거절하는 편이다. 그는 흑석동 집에서 오전부터 글을 쓴다. 요즘에는 시각 장애인을 만나러 다닌다. 이날 인터뷰 직전에도 대학로에서 시각 장애인을 인터뷰하고 오는 길이라고 했다.
“올해 1월 ‘현대문학’에 시각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한 단편 ‘파도를 만지는 남자’를 발표했어요. 제가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어요. 장애인 시설에서 일한 적도 있고. 장애인에 대한 소설도 앞으로 계속 쓰게 될 거 같아요.”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