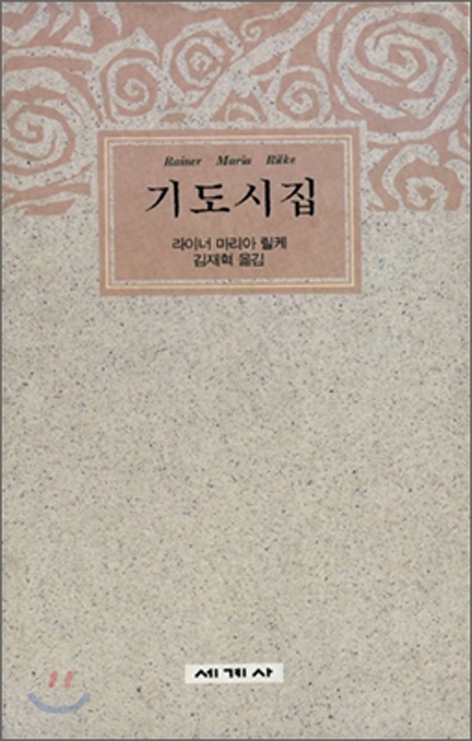

해마다 가을이 되면 꺼내는 책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 국어 교과서에서 만난 시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로 시작하는 시의 제목이 ‘가을날’이었으니까요.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던 시절이라 그랬겠지요. ‘가을날’의 구절들은 마음을 밟듯 다가왔습니다. 여름이라는 계절에 일어나는 일을 위대함이라는 한 마디로 규정하는 것이 시인에게 주어진 특권처럼 여겨졌고, “짙은 포도주 속에 마지막 단맛이 스미게 해주소서”와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집을 짓지 않습니다”라는 구절은 무릇 시인이란 언어와 사유의 숲을 자유롭게 거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기도시집’을 열면 많은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연필 볼펜 색연필 등 시를 읽으며 새롭게 다가오는 구절을 만날 때면 다시 밑줄을 긋곤 했습니다. 그 또한 습관이어서 다시 긋는 밑줄은 때마다 쌓이는 새로운 생각의 표시가 됩니다.
흔히들 ‘시’(詩)를 ‘말씀’(言)과 ‘사원’(寺)이 합해진 말로 이해합니다. 시장의 언어와 다른, 침묵을 지향하는 언어 말이지요. 그런 면에서 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시를 그렇게 이해하면 대번 이어지는 생각이 있습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언어로 진리를 전하는 설교자야말로 얍복 나루의 야곱처럼 언어와 씨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단어 하나를 찾기 위해 밤을 새우는 시인의 노고는 설교자에게도 요청되는 수고입니다.
사실 ‘기도시집’은 ‘가을날’이라는 시보다는 시집 속에 담긴 짤막한 기도 “오 주여, 그들 자신에게 그들 자신의 죽음을 주십시오. 그가 사랑 의미 고난을 겪은 그 삶에서 가버리는 죽음을”이라는 문장으로 오래전부터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고유한 죽음을 달라는 기도는 고유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겸허함과 간절함으로 다가옵니다.
‘기도시집’은 ‘수도자 생활의 서’와 ‘순례의 서’ 그리고 ‘가난과 죽음의 서’, 모두 3부로 구성돼 있습니다. 릴케 스스로 작품 표제를 ‘기도서’로 택한 것은, 자신의 시집이 통상적인 시집이라기보다는 성경처럼 독자의 손에서 떠나지 않고 읽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고 합니다. 시집에 자주 등장하는 수도사와 순례자는 릴케의 예술적 종교적 삶의 태도와 과제를 대변해주는 존재로, 시인 자신을 의미합니다.
거듭해서 밑줄을 그은 구절 중에는 “내가 믿는 것은 말해진 적이 없는 모든 것입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문장 앞에 서면 마음이 아뜩해집니다. 그러면서 혼잣말을 하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르는 만큼 말하는 것일지도 몰라.’
한희철 목사(정릉감리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