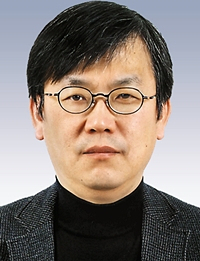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참사가 일어났다. 지난 토요일 밤 서울 이태원의 한 비좁은 골목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려고 몰려든 사람들이 밀리고 쏠리면서 156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고, 수많은 이들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핼러윈은 고대 켈트의 풍속에서 한 해의 마지막 날인 ‘마녀들의 날’을 뜻하는데, 슬프게도 그 원뜻대로 ‘가장 어두운 밤’이 돼 버린 것이다.
모든 사회적 참사는 재해가 아니라 재난이다. 함께 슬퍼하면서 고통을 나눌 마음이 없다면 인간성을 포기하는 일이고, 미안해하면서 고개 숙일 생각이 없다면 인간적으로는 물론이고 공복으로서는 더욱 부적절하다.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이나 “(공적) 축제가 아니라 (사회) 현상”이라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언사는 충격적이다. ‘내 책임 아니다’ ‘나한테 따지지 말라’ 말고 도대체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르겠다. 전적으로 ‘희생자 책임’이라는 뜻일까.
일찍이 송나라 재상 범중엄은 ‘악양루기’에서 말했다. “무릇 어진 사람은 천하의 근심은 누구보다도 먼저 근심하고, 천하의 즐거움은 모든 사람이 즐거워한 뒤에 즐긴다.” 세상의 슬픔과 걱정을 나의 슬픔과 근심으로 여기지 못하고, 이를 회피하고 덮으려고만 한다면 어질다 할 수 있겠는가. 불인한 자들이 이끄는 공동체에서는 사람의 삶이 도탄에 빠져서 손발 둘 곳이 없어지는 각자도생의 지옥으로 떨어진다.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으려면 입 닫고 침묵하는 편이 낫다. 사회적 슬픔이 국민의 울화로 바뀌지 않도록 말이다.
주디스 루이스 허먼 미국 하버드의대 교수의 ‘트라우마’(사람의집 펴냄)에 따르면 인간적으로 견딜 수 없을 만큼 참혹한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흔히 이를 의식 바깥으로 몰아내서 망각하려 한다. 그러나 비극적 참사는 묻히기를 거부한다. 아무 일 아닌 듯 이를 부정하고픈 심정만큼 강력한 힘이 망각을 거부하는 힘이다. 억압된 것은 반드시 되돌아온다. 허먼은 이야기한다.
“오래된 지혜는 유령들로 가득 차 있다. 이 유령들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전해지기 전에는 무덤에서 안식하기를 거부한다. 끔찍한 사건을 기억하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 질서의 회복과 개별 피해자의 치유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아랑전’ ‘장화홍련전’ 등 우리 옛이야기를 보면 ‘억울한 희생자’의 목소리가 분출하는 일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지도자는 하룻밤에 목숨마저 빼앗긴다. 반면에 좋은 지도자는 담대한 마음과 굳센 마음으로 희생자와 대면해 그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고 이를 책임지고 해결함으로써 질서를 회복하려 애쓴다. 공직자는 책임의 용기가 있어야 한다. 무질서에 휘말려 돌연한 죽음에 이른 희생자의 억울한 마음을 푸는 공적 해원(解冤)과 이를 통해 사회적 애도를 촉진할 때만 만연한 슬픔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시무시한 사건을 부정하려는 권력의 의지가 이를 밝혀 드러내려는 마음을 억누르면 사람들 가슴에는 상처, 즉 트라우마가 남는다. 진실은 사실에서 출발하지만 단순히 사실의 적시만 뜻하진 않는다. 참사의 직접적 희생자뿐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나머지 생존자, 즉 국민 모두를 위로하고 회복시켜 일상으로 되돌리는 치유의 서사를 작동시켜야 한다. 참사의 원인을 희생자나 우발성에 돌리는 일은 무책임하다. 무책임한 망언들은 희생자를 원혼으로 만들고, 가족의 마음에 못을 박으며, 시민들의 정신적 상처를 덧나게 할 뿐이다.
무감각에서 벗어나 인간적 연민을 품고 천하의 근심을 나의 근심으로 지는 공적 책임의 서사를 받아들여 희생자의 영혼을 위무해야 한다. 이 참사가 우리의 마지막 참사가 되도록, 사회의 무너진 안전을 다시 세우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함께 모여서 마음껏 축제를 즐겨도 괜찮은 세상을 이룩했으면 좋겠다.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









